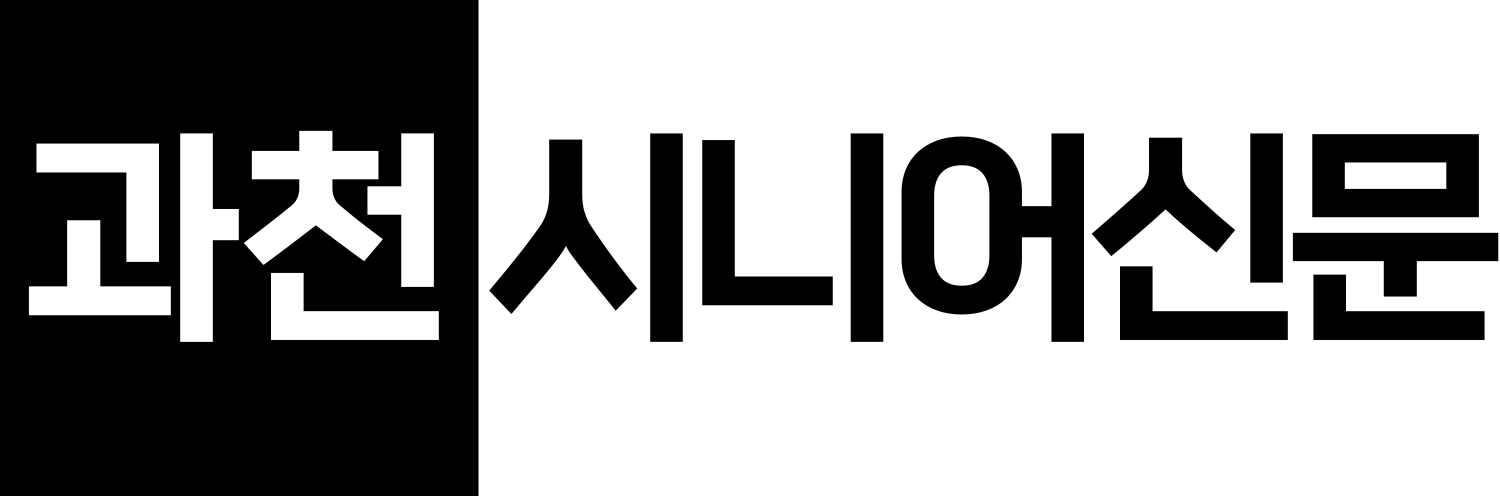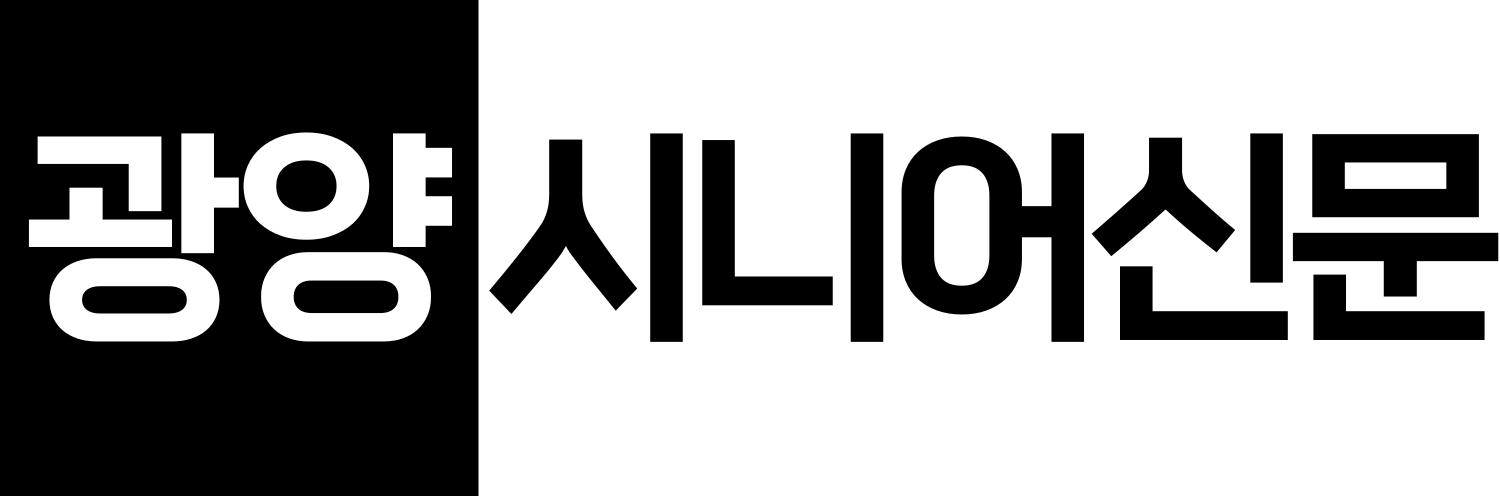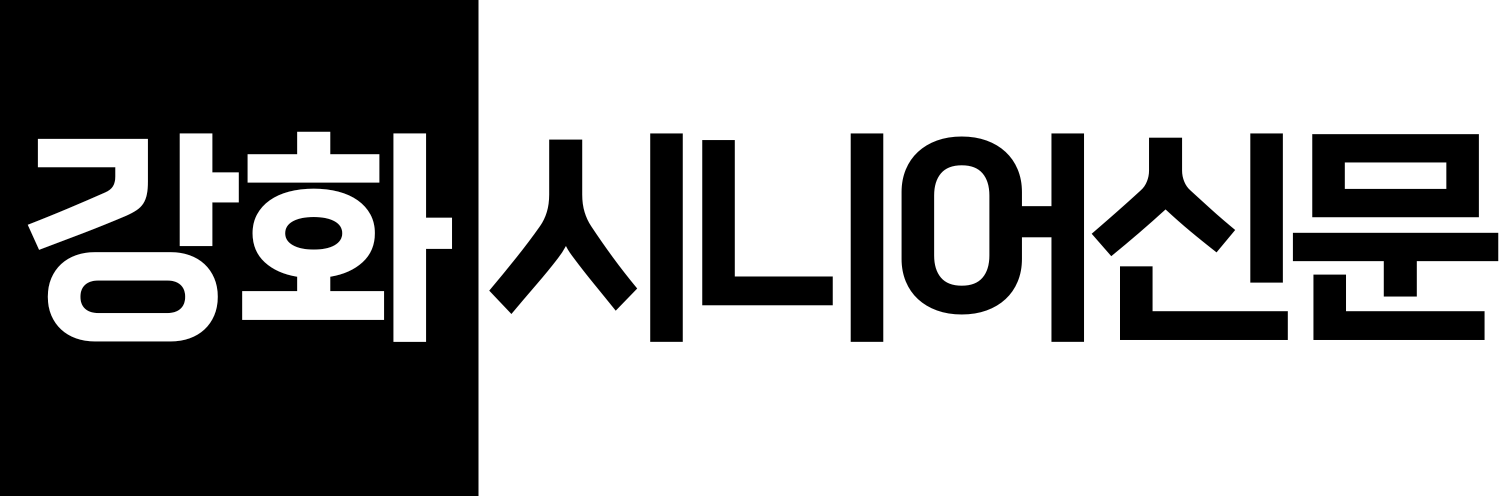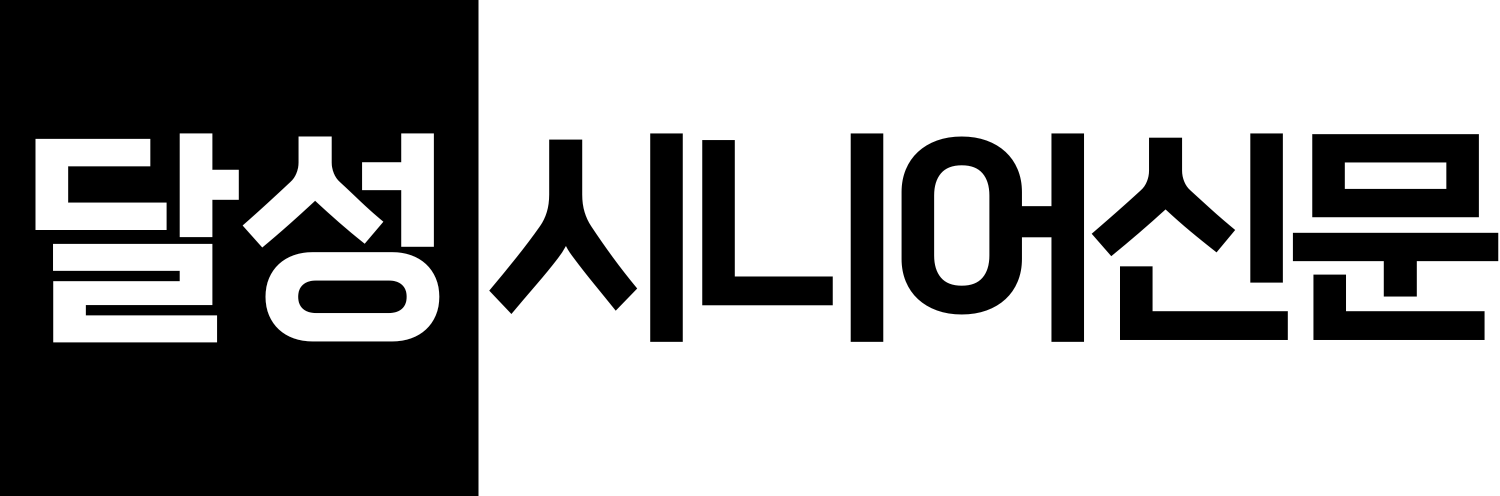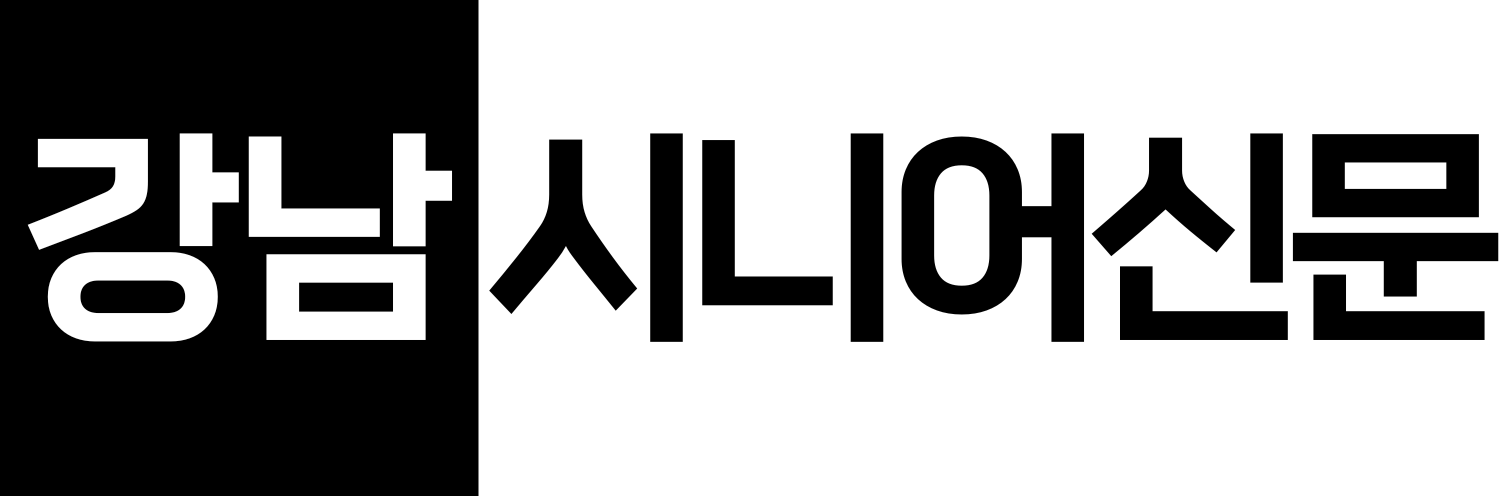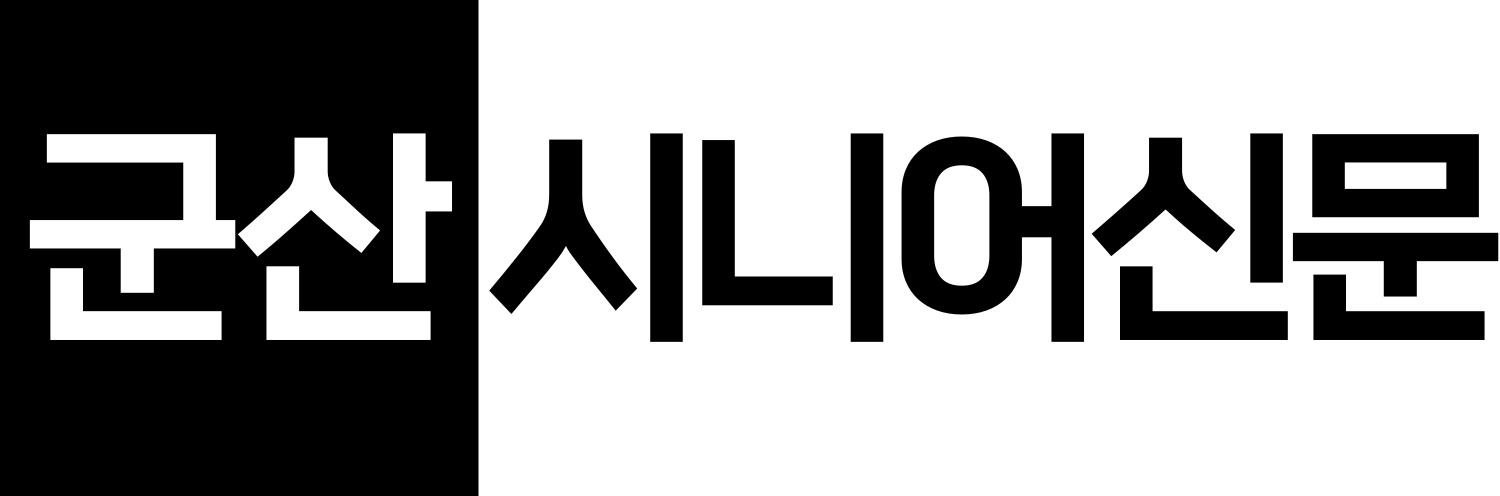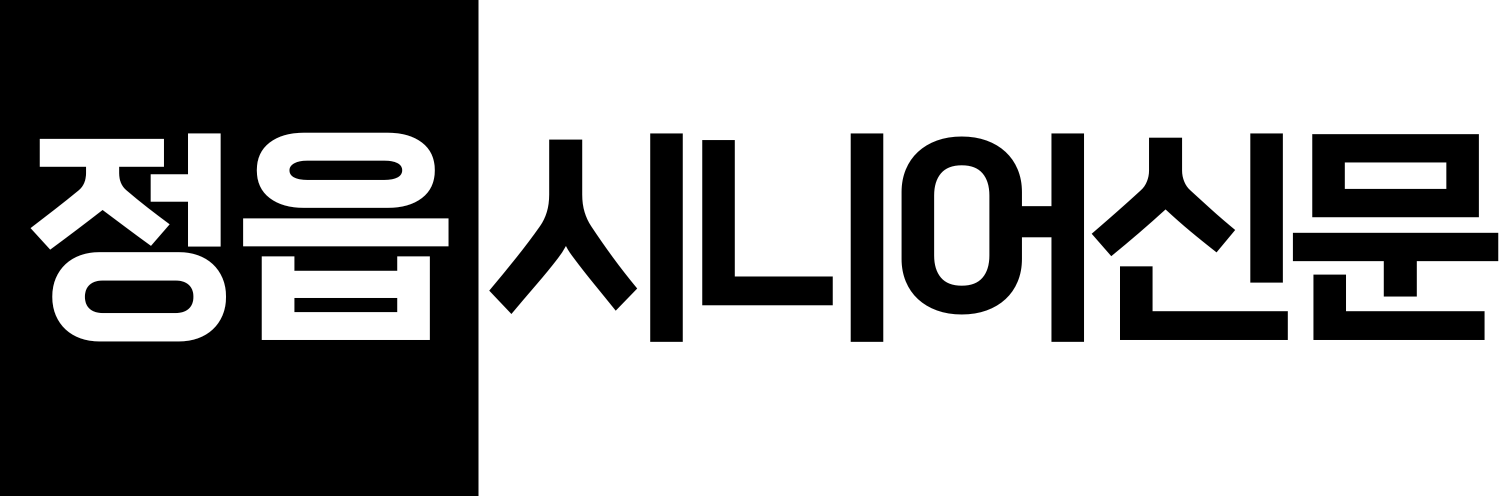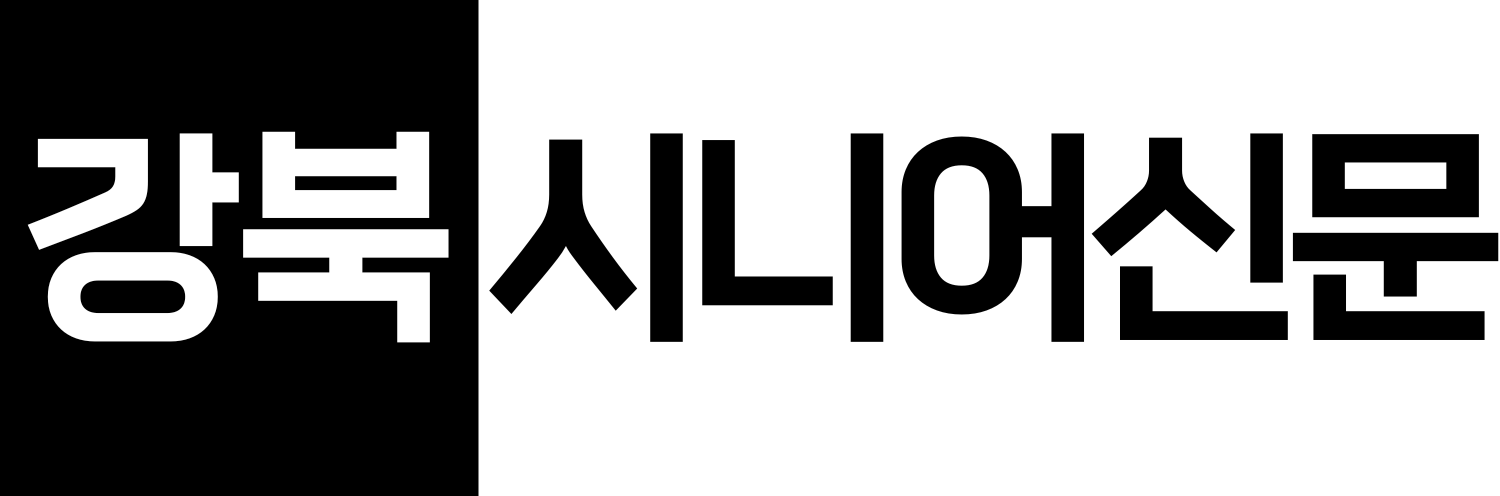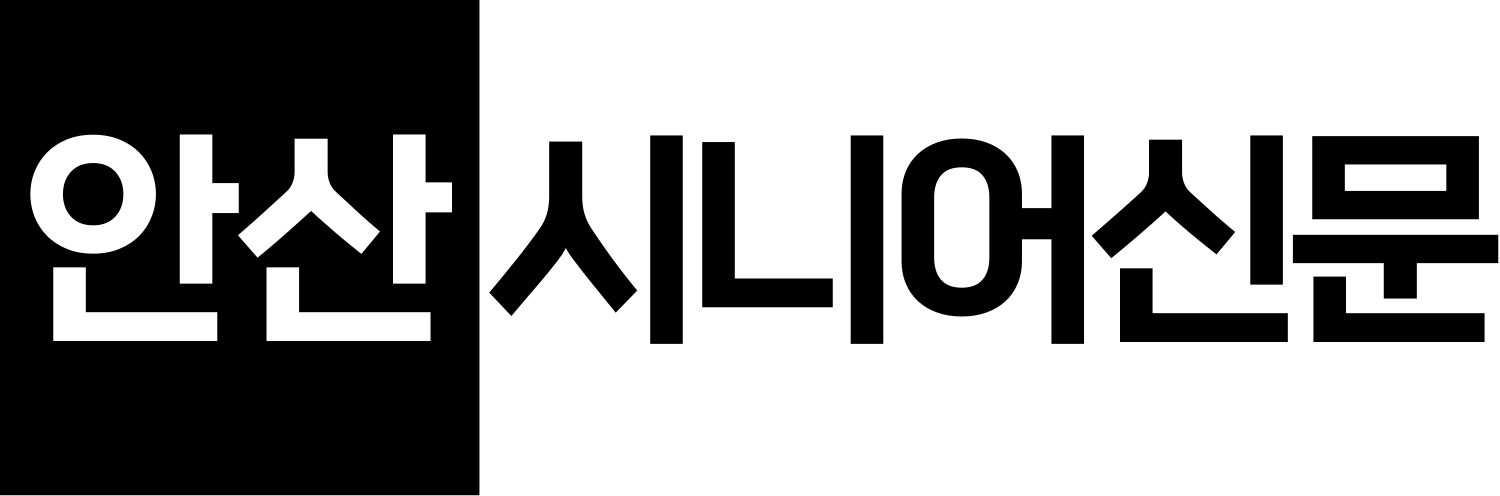다시 걷는 고향길 – 벌교에서 만난 시간들
“고향은 풍경이 아니라 사람이고, 냄새이고, 기억이었다.”
서울 살이 반세기.
그 긴 시간을 지나, 나는 다시 벌교의 골목을 걷는다.
잊은 줄 알았던 고향의 냄새와 소리, 사람들의 인심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기억을 걷다 – 벌교 시내에서 만난 옛 풍경
봄바람이 불던 날, 나는 벌교 시내를 천천히 걸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 장날의 북적임, 논길 위로 비치던 하늘…
그리운 풍경들이 발밑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고, 잊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피어올랐다.
“벌교에선 주먹 자랑하지 마라”의 진짜 뜻
어릴 적 자주 들었던 말, “벌교에선 주먹 자랑하지 마라.”
그 의미를 나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 주먹은 단순한 힘의 상징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항거한 의병장 안규홍의 ‘정의로운 외침’이었다.
머슴살이하던 청년이 의병을 조직하고,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순국한 안규홍.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벌교 사람들의 자부심으로 남아 있다.
동상 앞에 서면, 누구나 자연스레 고개를 숙이게 된다.
조용한 인사, 벌교의 시간들
벌교 시내 곳곳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다.
나철 선생의 부조, 작곡가 채동선의 동상,
그리고 무명의 이들이 남긴 삶의 흔적들.
그 조형물들은 말없이 길가에 서 있지만,
그 앞에 서면 고향을 찾아온 이들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넨다.
“그래, 잘 돌아왔다”고.
태백산맥의 무대, 소화다리 위에서
벌교는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이기도 하다.
소설 속 인물들이 살아 숨 쉬던 술도가, 보성여관, 그리고 소화다리…
나는 그 길을 따라 걸었다.
지금은 잔잔한 물만 흐르는 소화다리 아래,
시대의 아픔과 희망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듯했다.
분열과 용서, 고통과 사랑이 그 물결 속에 함께 흘렀다.
사람 냄새 나는 벌교 전통시장
벌교 전통시장은 여전히 정겨웠다.
비싸진 생선 값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의 ‘정’이었다.
쌀전 앞에서 흥정하는 할머니,
풀빵을 굽는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는 따뜻한 고구마 한 조각…
서울살이에서 잊고 지냈던 사람 냄새가
이곳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지만,
길가의 나무, 바람, 바다가 “어서 와”라며 나를 반겨주었다.
지금, 나는 다시 이곳에서 산다
돌아온 고향, 다시 채우는 시간
🧓 “길가의 나무, 들판의 바람, 벌교항 너머 바다가 ‘어서 와’ 하고 속삭여 주었다.”
이제 나는 고향에서 또 하나의 시간을 채워간다.
기억을 꺼내어 다시 꿰고,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를 나눈다.
고향은 여전히, 고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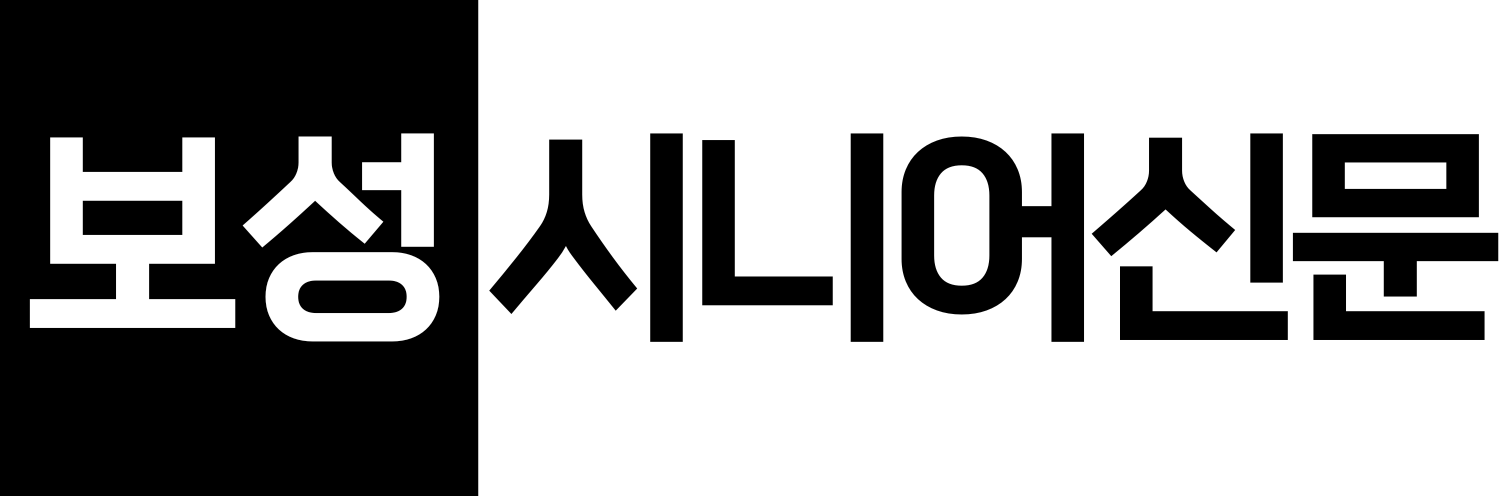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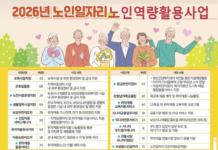


![[기사수첩] 옛 낙안군 천년 물줄기, 상송저수지서 벌교 갯벌까지…물이 이어온 낙안·벌교 역사](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1/낙안에서-벌교로-내려오는-하천-218x150.png)

![[보성에서의 문학산책] (2)나쓰메 소세키 ‘도련님’](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5/12/도련님책표지-218x15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