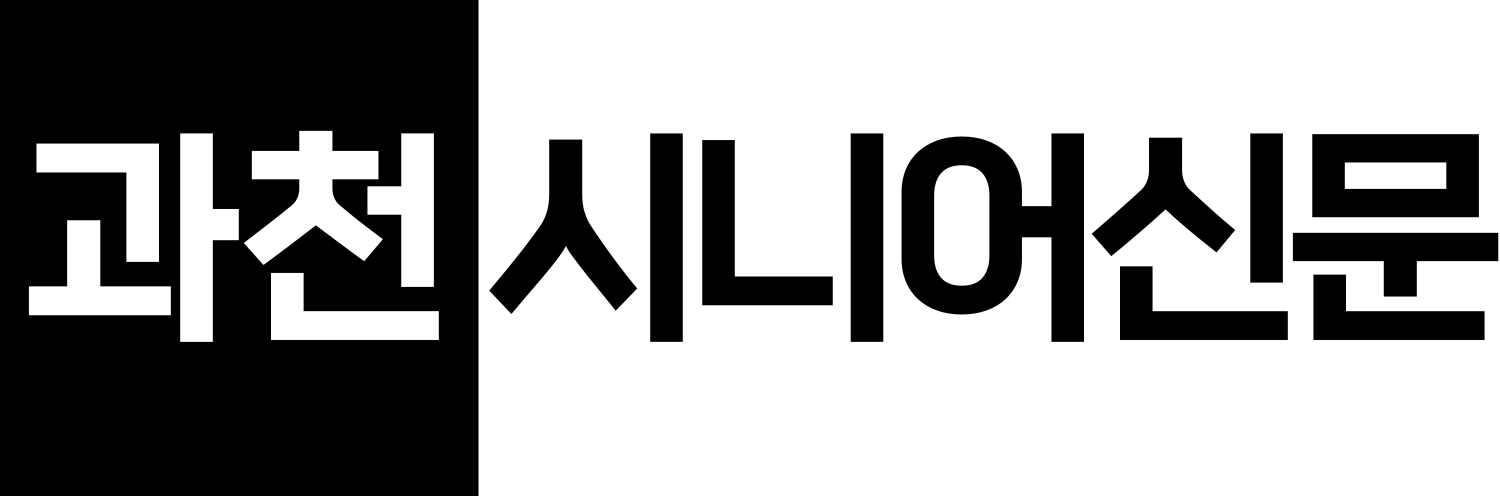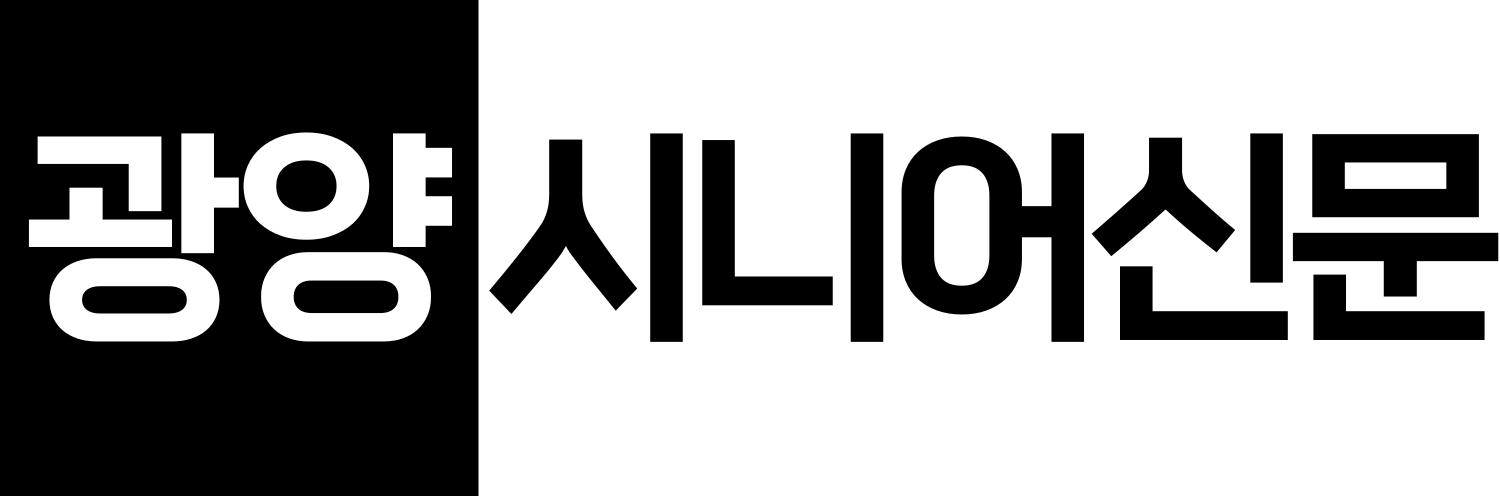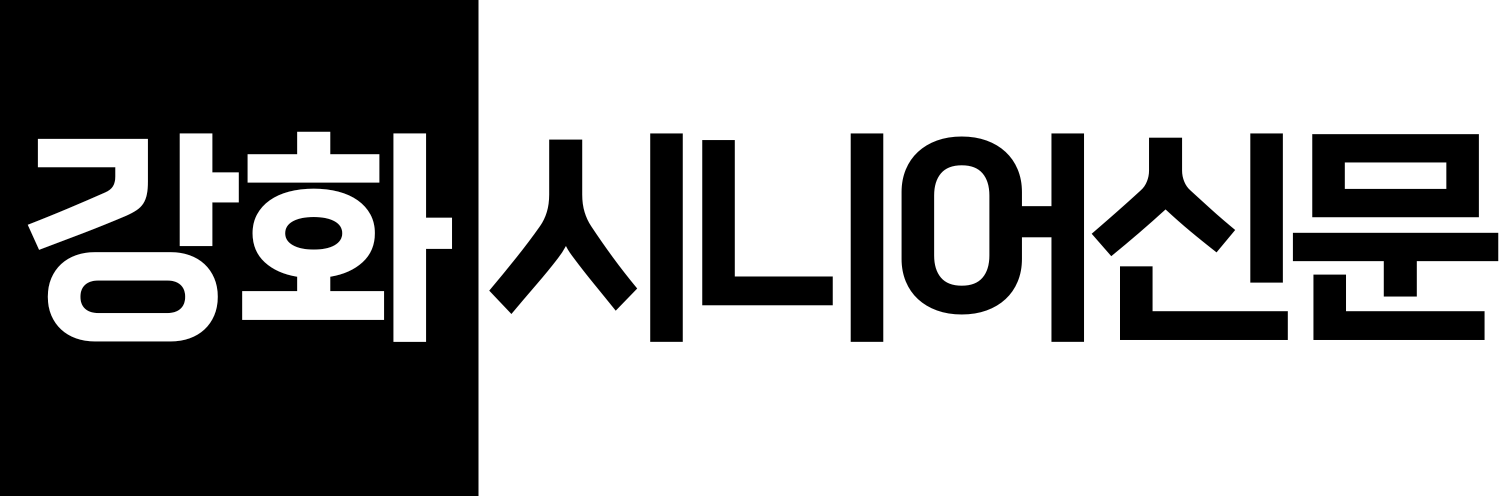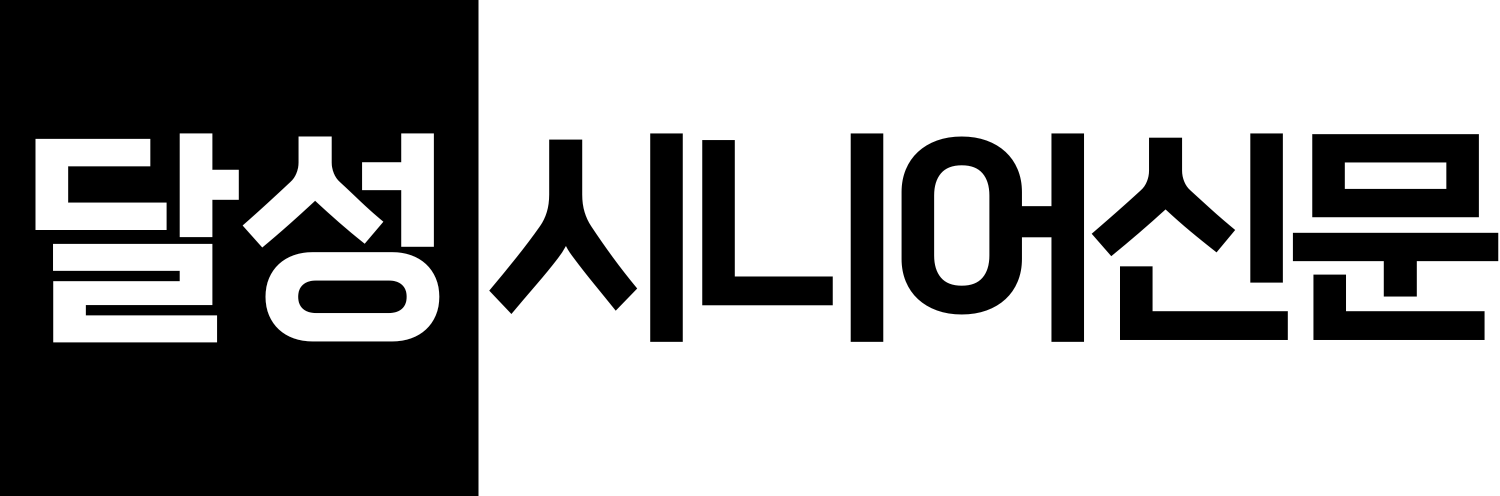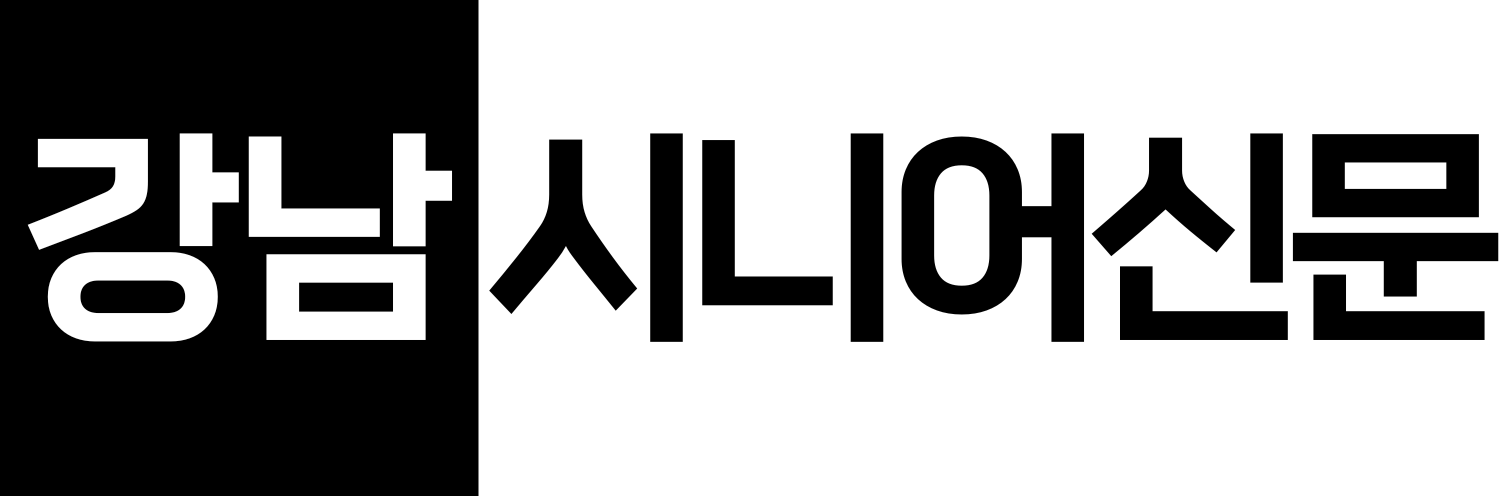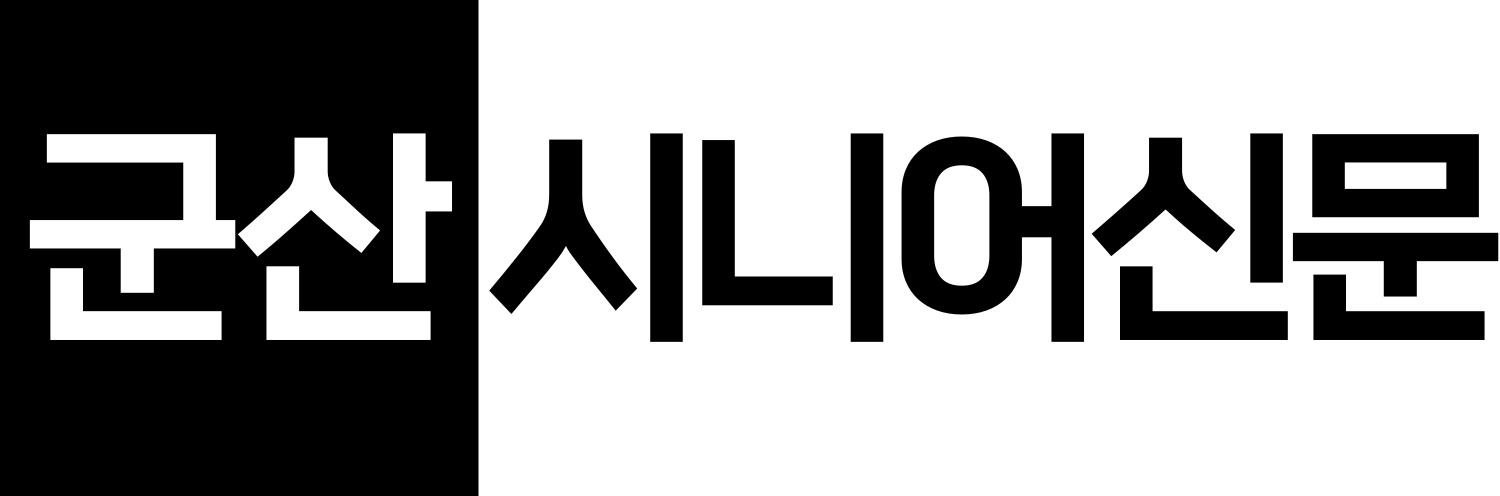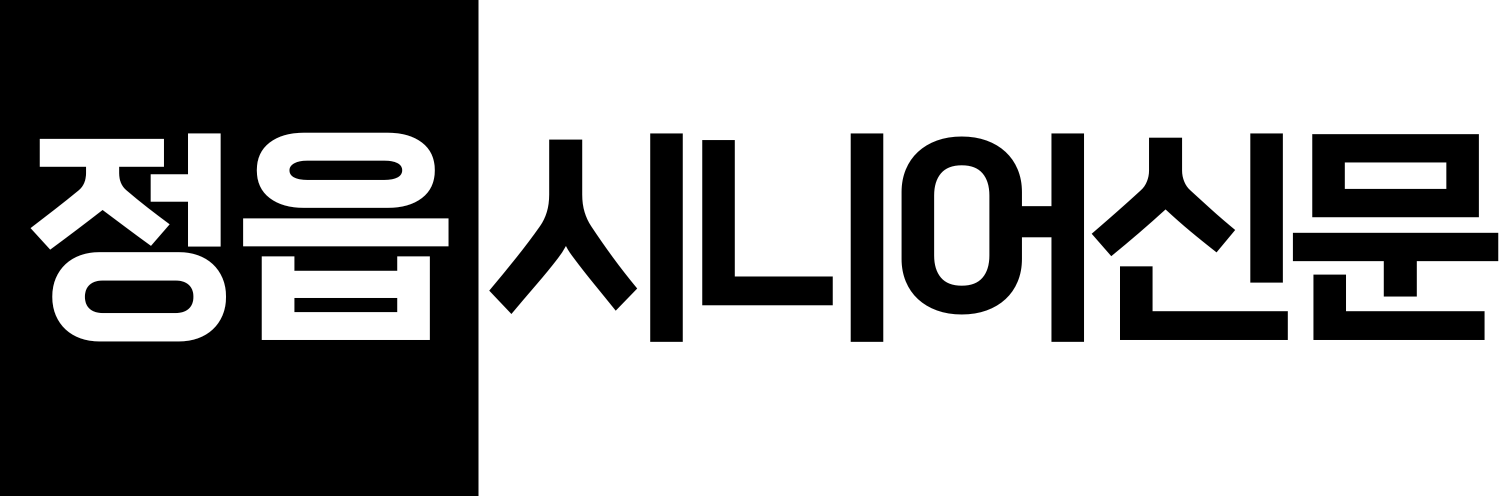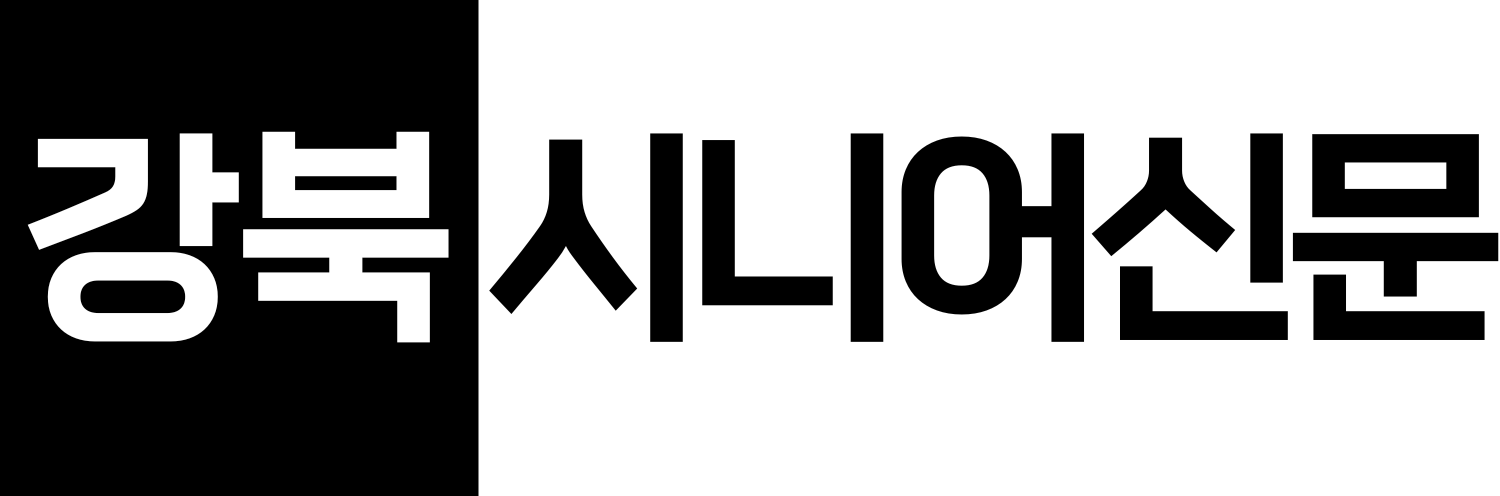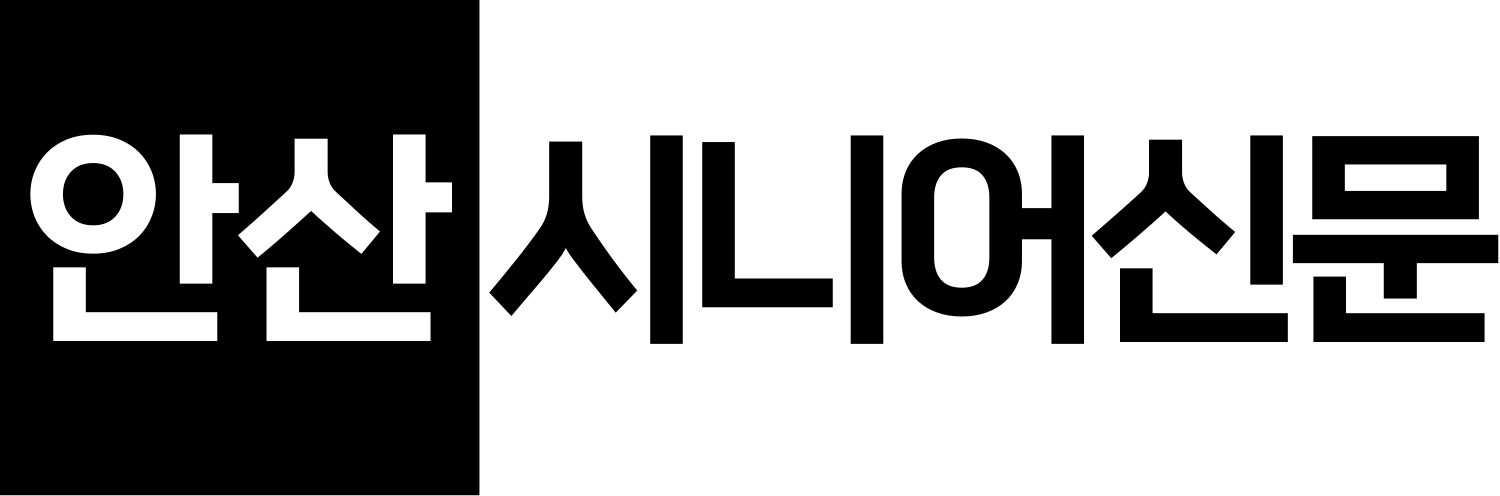벌교 골목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한 ‘삼화목공소’. 낡은 한옥 지붕 아래 걸린 작은 간판은 1958년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세월을 견뎌왔다. 문 앞에 서니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기계음이 리듬처럼 울려 퍼진다. 순간, 소설 『태백산맥』 속 풍경이 눈앞에 겹쳐졌다.
삼화목공소는 단순히 가구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벌교 사람들의 삶을 담고, 그들의 기억을 깎고 다듬어낸 공간이었다. 손끝으로 이어온 수작업의 온기, 톱밥이 흩날리는 공기 속에는 잊혀가는 시대의 숨결이 스며 있다.
공장식 가구가 쏟아져 나오는 오늘날에도 이 목공소의 톱날은 여전히 쉼 없이 움직인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의 소리가 아니라, 벌교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증언하는 오래된 음악이다.
간판 위 ‘1958년 창업’이라는 글귀를 오래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 작은 목공소가 지켜낸 세월이야말로 벌교라는 고장의 자부심이자, 『태백산맥』의 숨결이 오늘도 살아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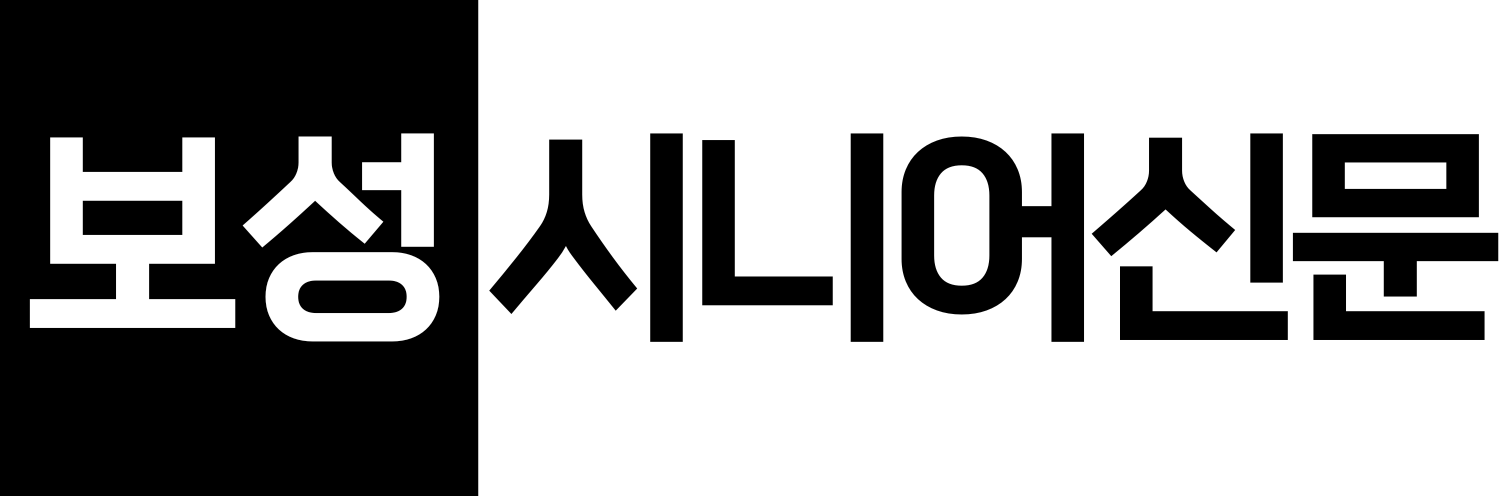



![[기자수첩] 초록잎 펼치는 세상, 봄 문턱에서 만난 생명의 숨결](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2/당산나무-봄소식-218x15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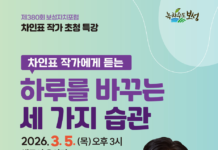

![[기자칼럼] “모자라면 더 먹어”, 그 따뜻한 밥상이 멈췄다](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1/소화밥상-218x150.png)

![[기자수첩]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억의 플랫폼, 벌교역](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2/벌교역-218x15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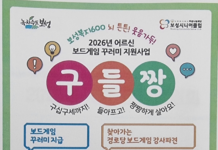
![[기자수첩]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볕이 머무는 양지개… 방죽에 새겨진 생의 기록](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2/장양2-218x15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