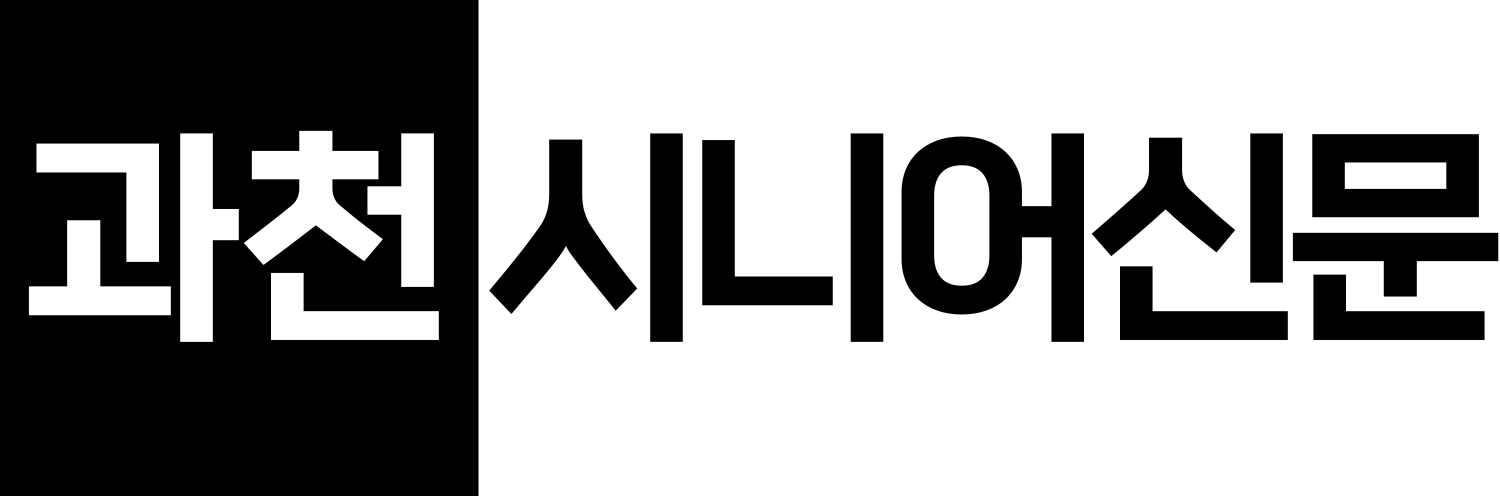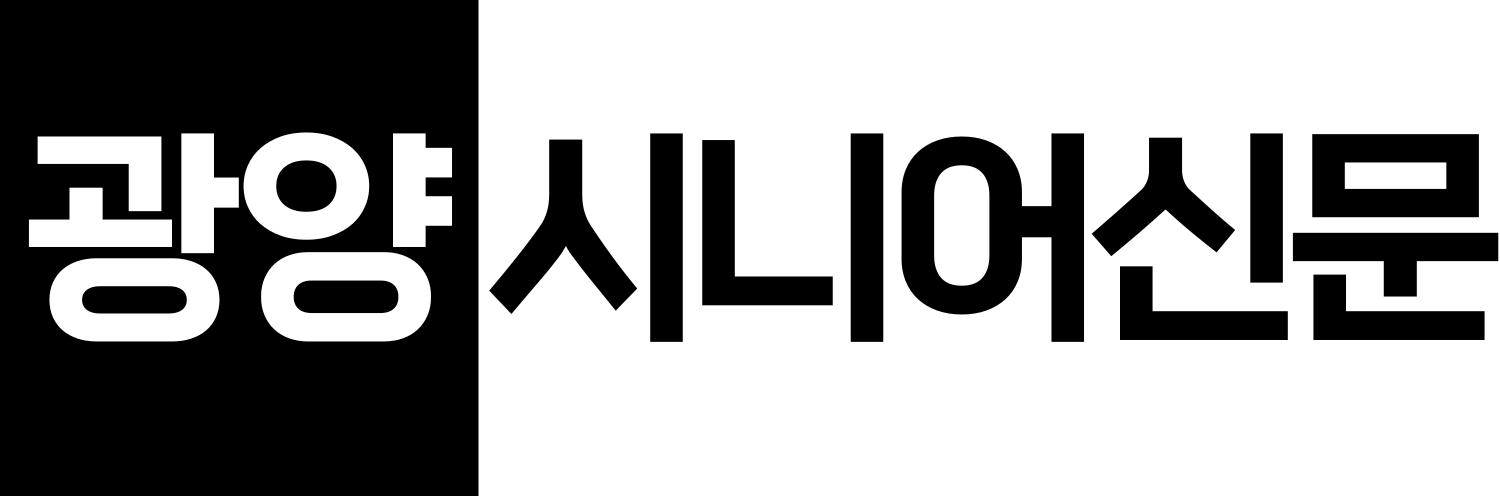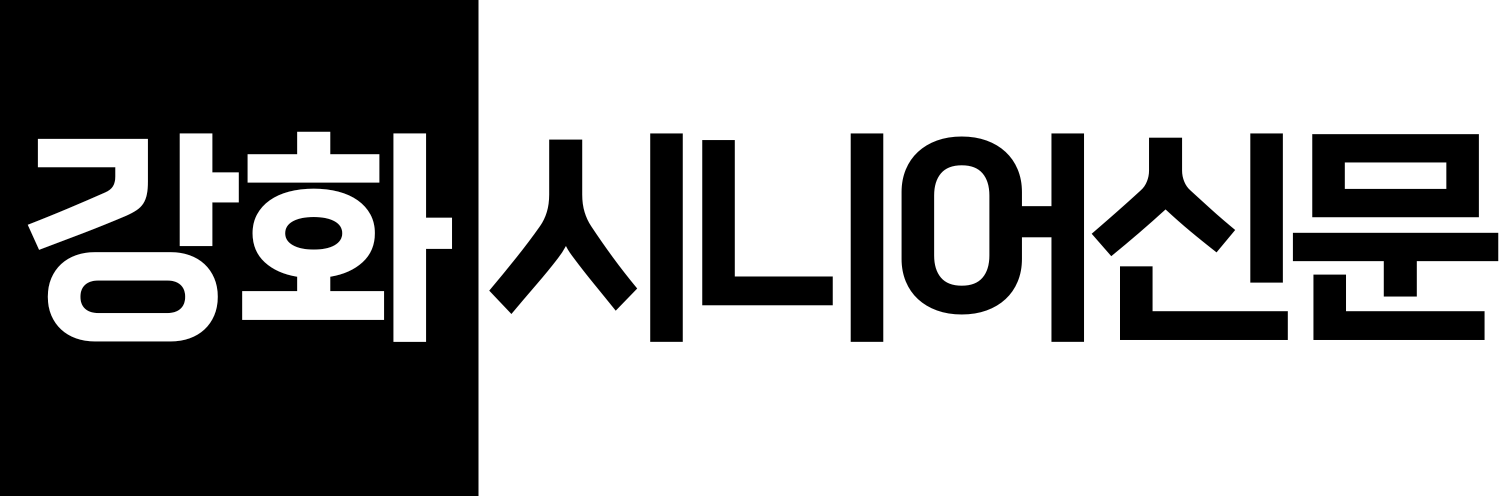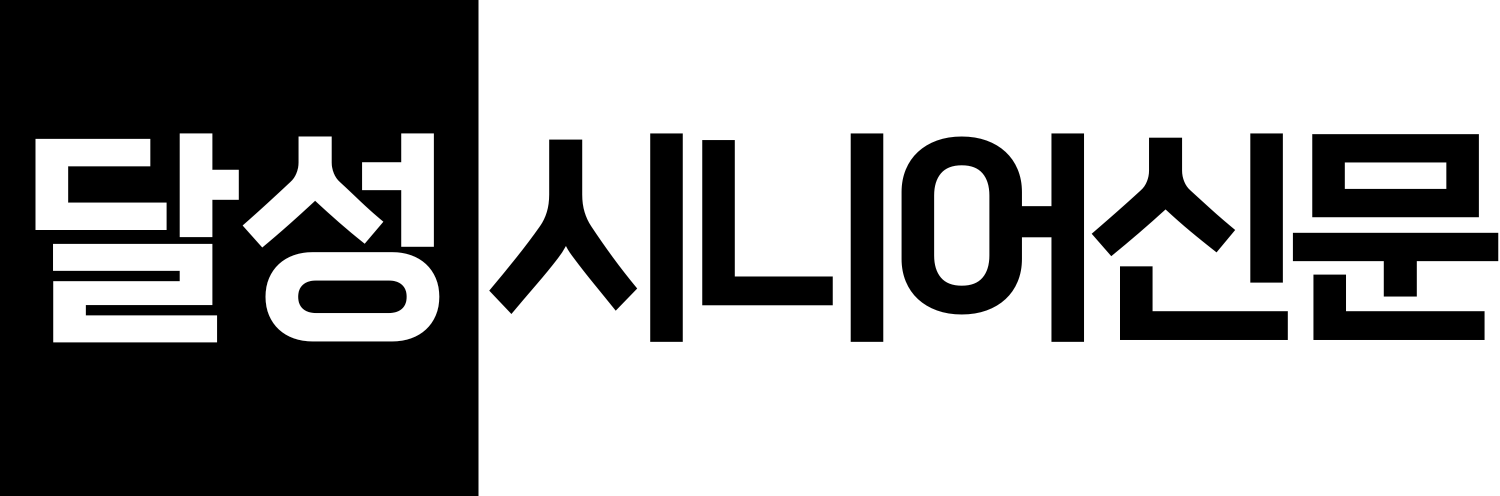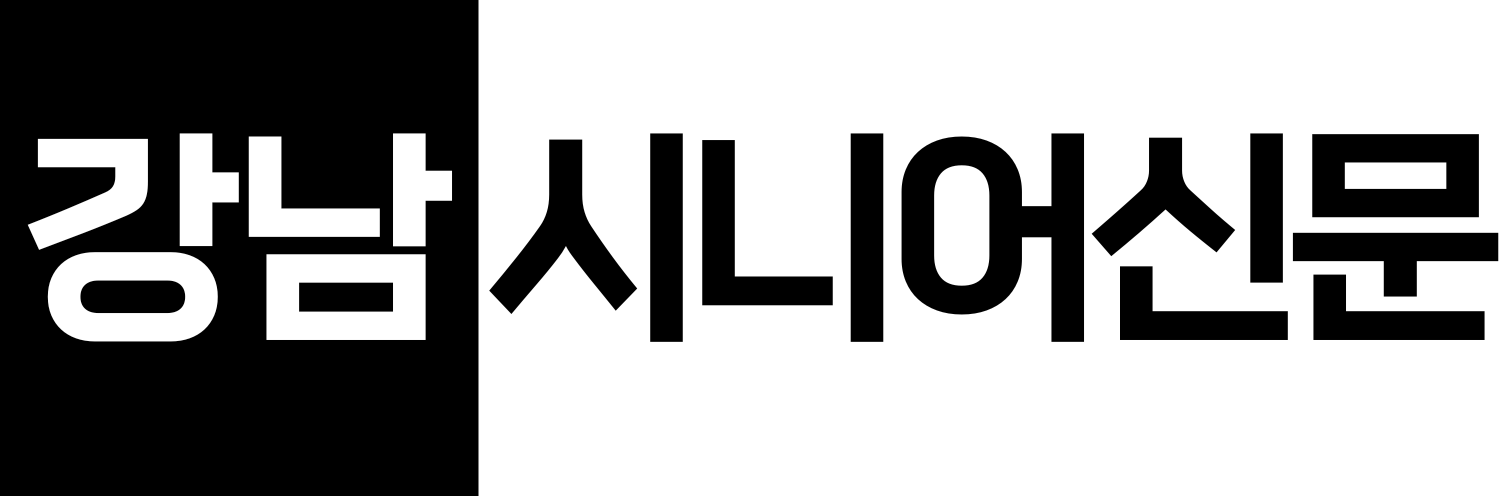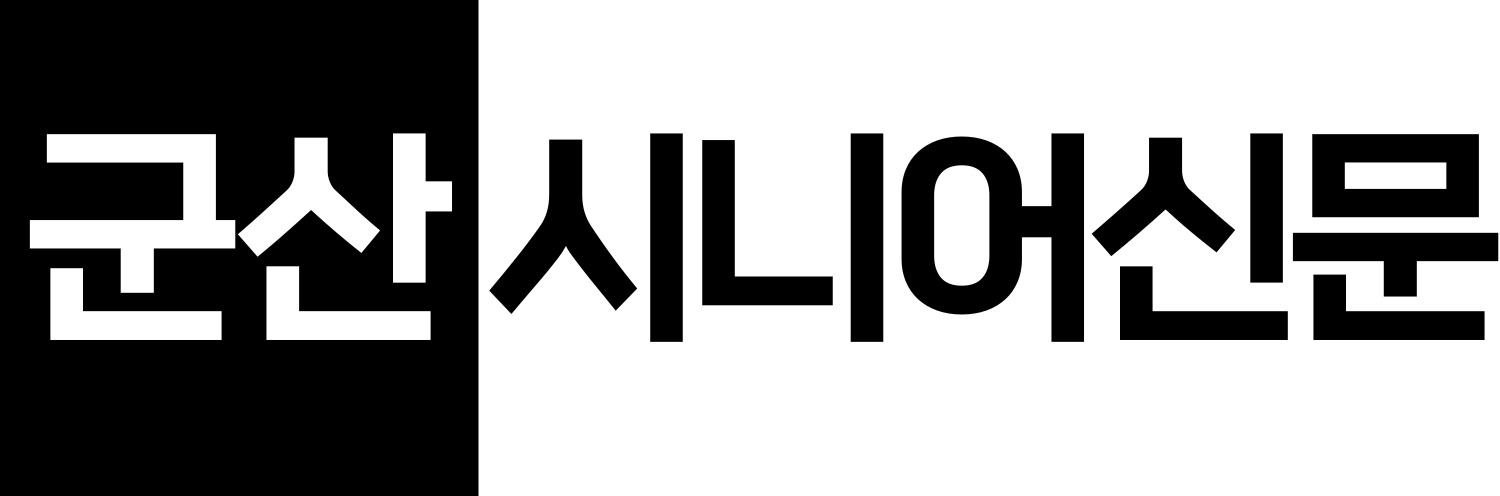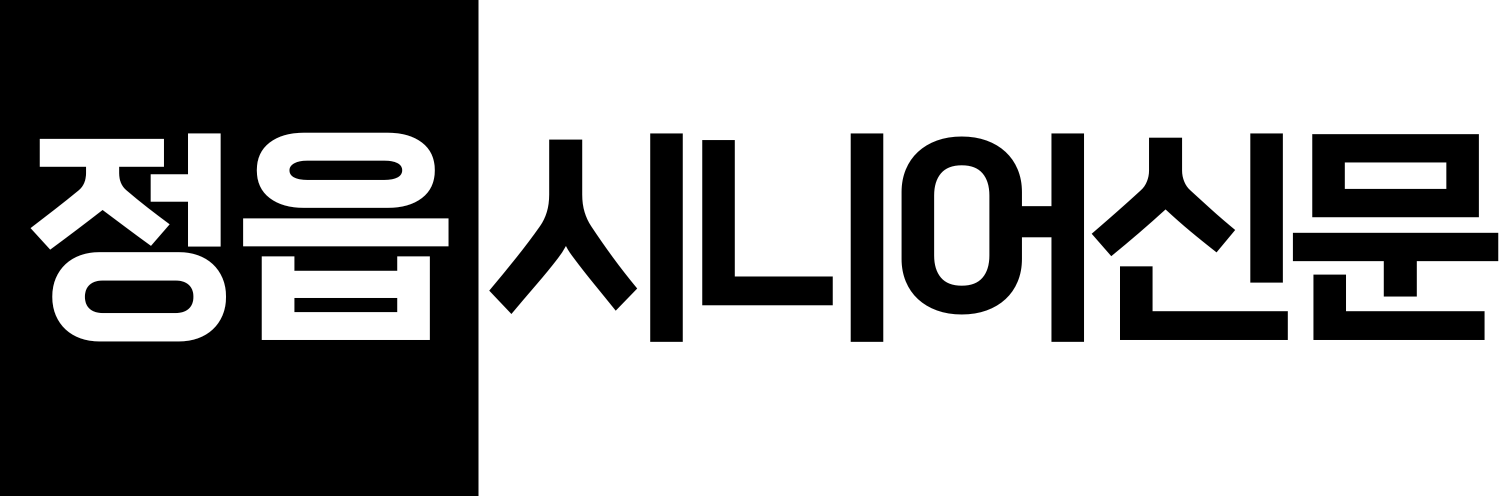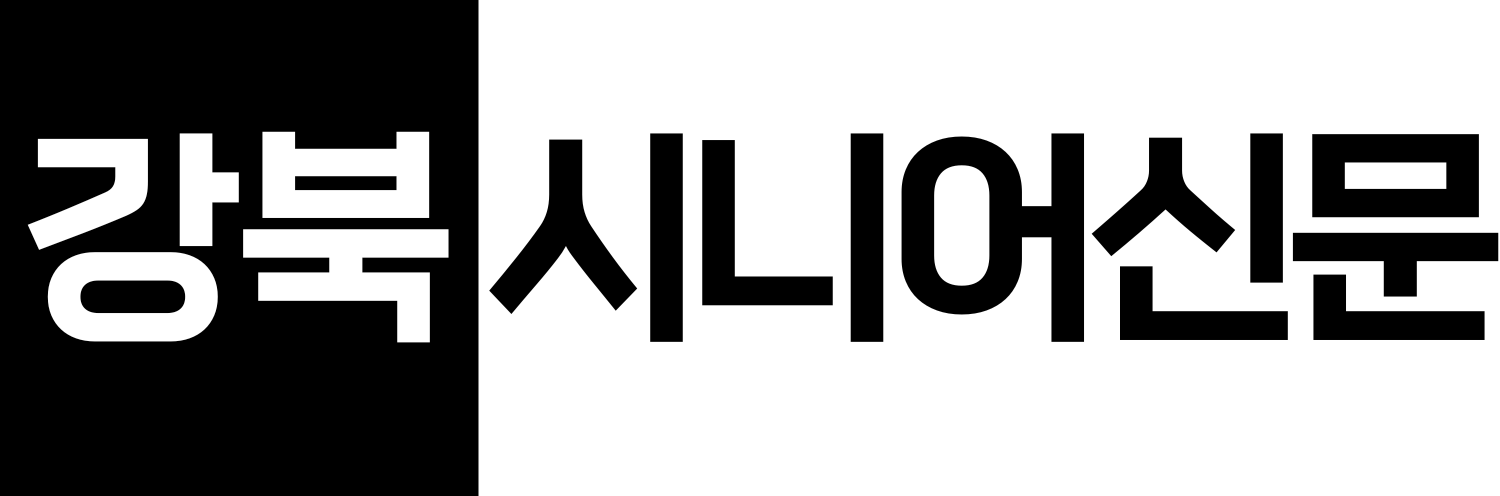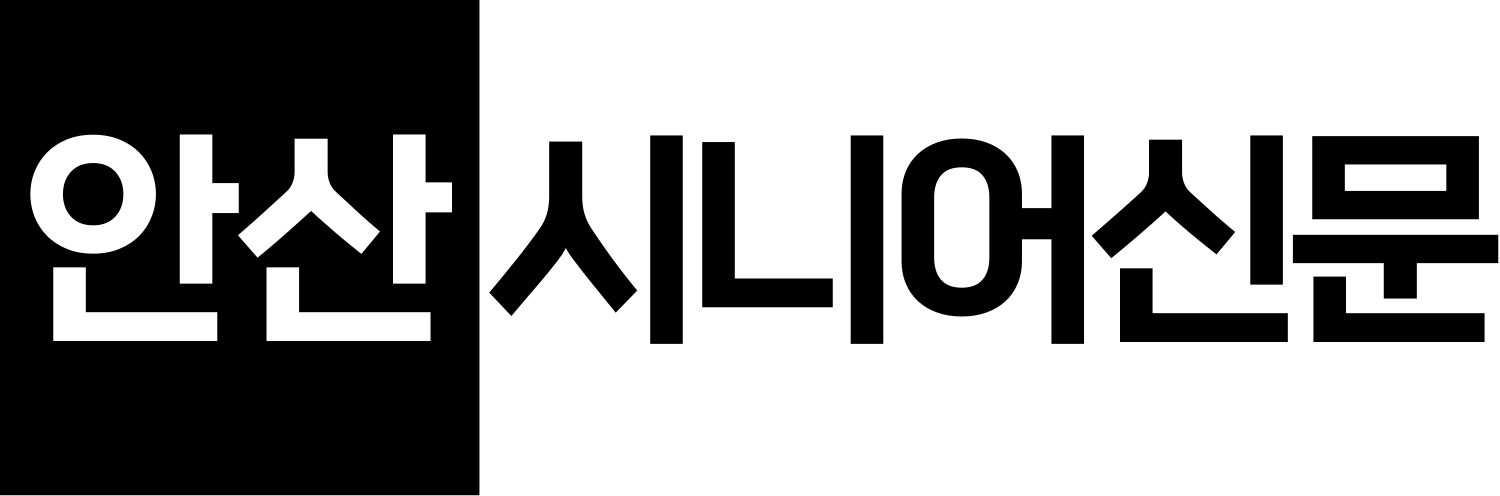벌교의 골목을 지날 때면 오래전 학교 종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벌교남국민학교와 벌교북국민학교. 지금은 각각 벌교초등학교와 벌교여자중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세월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종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시절의 숨결은 여전히 운동장의 흙냄새 속에 남아 있다.
두 개의 학교, 두 개의 세계
벌교에는 두 개의 국민학교가 있었다. 읍내 중심의 ‘남국민학교(현 벌교초등학교)’와 외곽지대의 ‘북국민학교(현 벌교여자중학교)’. 단순한 지리적 구분 같지만, 그 속에는 시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남국민학교는 주로 읍내 상류층 자녀들이 다녔고, 북국민학교는 농촌 외곽의 아이들이 다녔다. 학생 수와 시설, 복장과 생활 수준에서 차이가 뚜렷했다.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남초, 북초”를 나누며 서로를 구분했고, 남초 학생들이 북초를 ‘똥통 학교’라 부르며 놀리는 일도 있었다. 웃음소리 속에 이미 도시와 농촌, 문안과 변두리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시대의 상흔이 스민 운동장
1940년대 후반, 학생 수 증가로 1946년 ‘벌교공립국민학교(남초)’에서 분리된 ‘벌교북국민학교’가 문을 열었다. 이곳은 농어촌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마을의 중심이었다. 목조 교사와 넓은 운동장은 아이들의 발자국과 웃음소리를 품은 따뜻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6·25 전쟁과 여순사건 전후로 학교의 운동장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군중집회와 열병식이 열리던 곳이자, 때로는 ‘인민재판’의 장소가 되었다.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에서 어른들이 끌려가고 총성이 울리던 그날의 기억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배움의 길, 세월의 길
벌교남국민학교의 뿌리는 1909년 사립 유신학교로 시작된다. 이후 벌교공립보통학교(1917), 벌교남심상소학교(1938)를 거쳐 광복 이후 벌교남국민학교로 이어졌고, 현재의 벌교초등학교가 되었다. 이 학교의 운동장은 시대마다 군중 집회, 연설, 열병식이 열린 역사적 공간이었다.
1950~70년대, 벌교는 ‘아이들의 고장’이었다. 교실마다 빽빽이 앉은 학생들, 흙먼지를 일으키며 뛰놀던 운동장, 하굣길을 가득 메운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 분교가 생길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고, 그 활기는 마을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분교는 문을 닫고, 운동장은 한결 고요해졌다. 아이들 대신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늘었다.
세월이 지우지 못한 경계
전쟁과 빈부, 도시와 농촌의 경계는 아이들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졌다. 1950~70년대까지만 해도 ‘문안 사람’과 ‘문밖 사람’이라는 말이 존재했고, 생활과 신분의 차이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체득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경계는 성장 후에도 의식 깊숙이 남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남초와 북초를 오가던 아이들은 어느덧 70~80대 어르신이 되었고, 그 시절의 상처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다. 서로 다른 학교를 다녔지만, 결국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대를 살아냈던 동무들이다.
종소리의 여운
오늘의 벌교초등학교와 벌교여자중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그곳은 한 세대가 꿈꾸고, 배우고, 함께 자라난 삶의 무대다.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와 종소리가 메아리치던 남국민학교와 북국민학교. 지금은 이름을 달리했지만, 그 시절의 온기는 여전히 운동장의 흙냄새 속에 남아 있다.”
이제 종소리는 멈췄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과거의 경계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다시 한 운동장에서 웃을 수 있는 지금의 벌교. 그 평화로운 풍경이야말로 세월이 남긴 가장 따뜻한 화해의 소리일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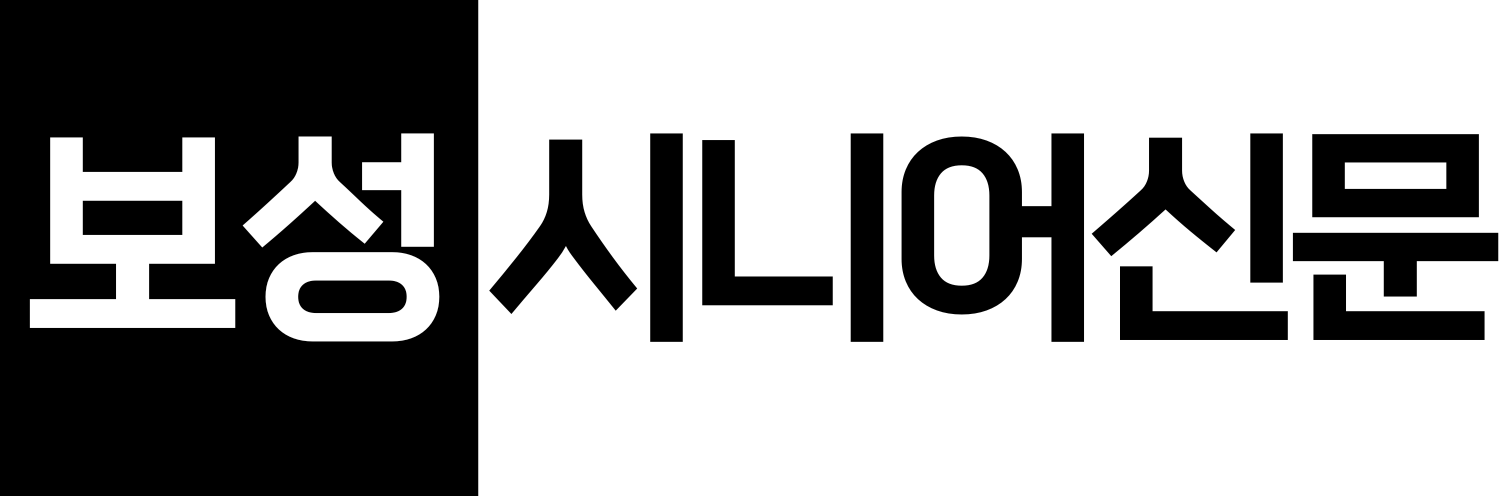


![[기자수첩] 초록잎 펼치는 세상, 봄 문턱에서 만난 생명의 숨결](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2/당산나무-봄소식-218x15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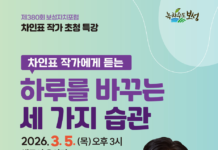

![[기자칼럼] “모자라면 더 먹어”, 그 따뜻한 밥상이 멈췄다](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1/소화밥상-218x150.png)

![[기자수첩]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억의 플랫폼, 벌교역](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2/벌교역-218x15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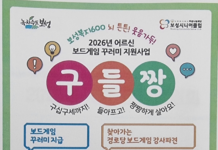
![[기자수첩]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볕이 머무는 양지개… 방죽에 새겨진 생의 기록](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2/장양2-218x15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