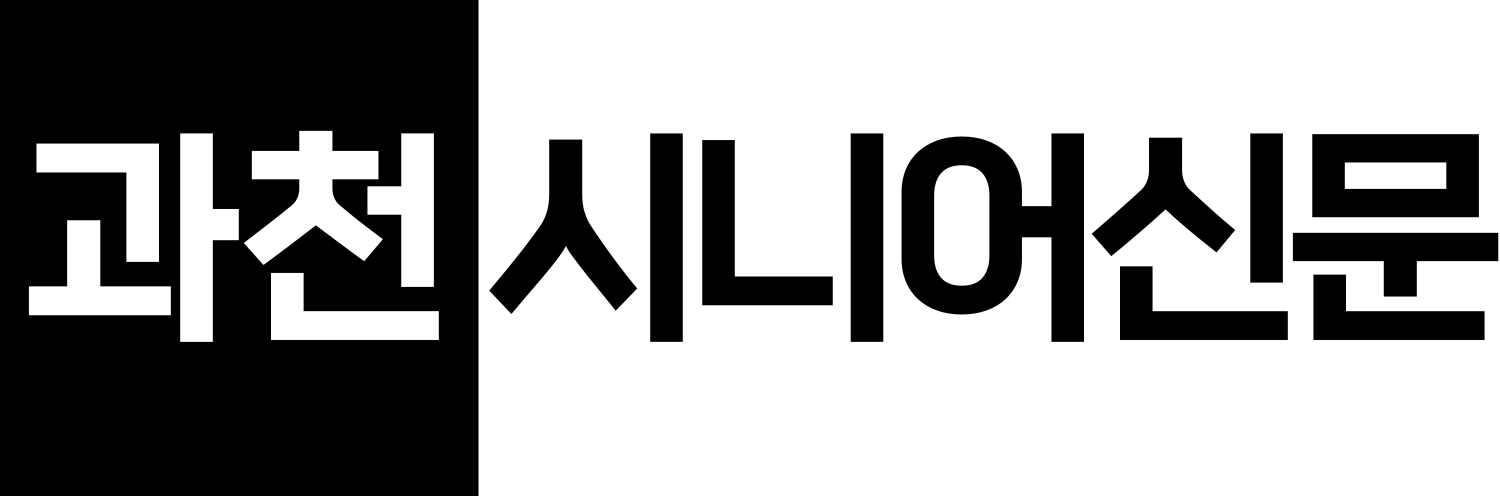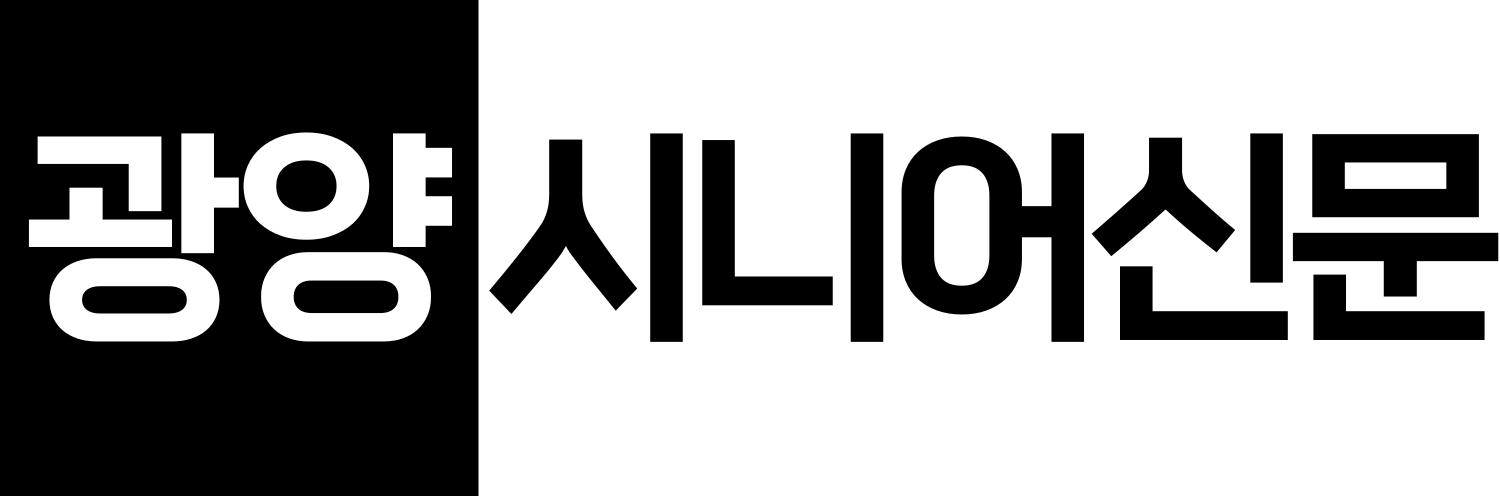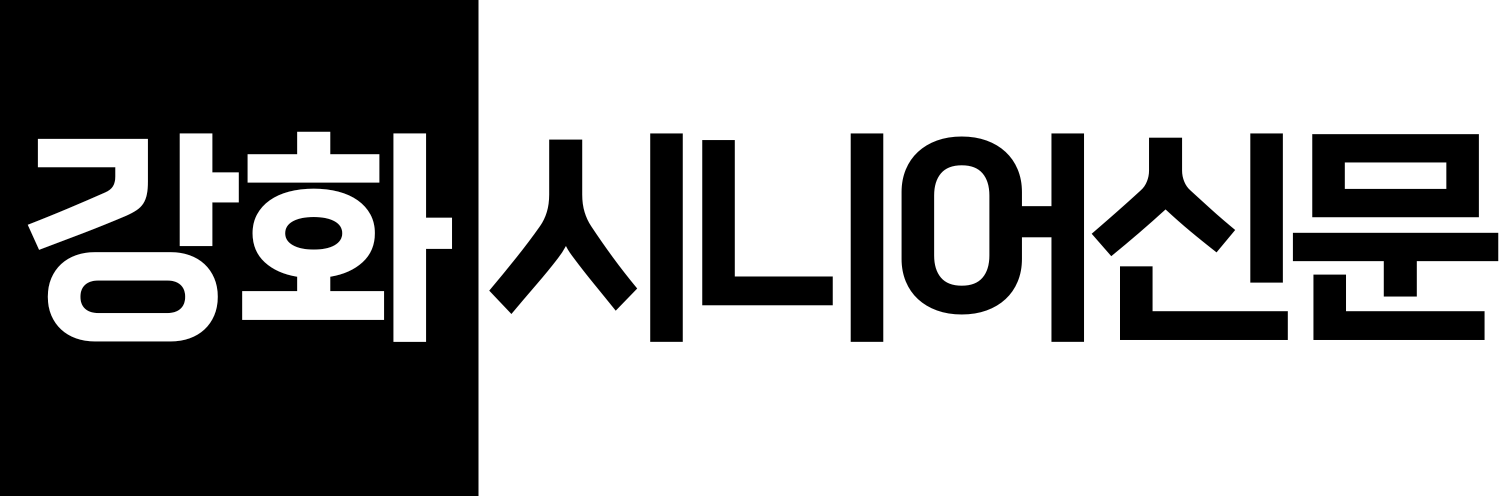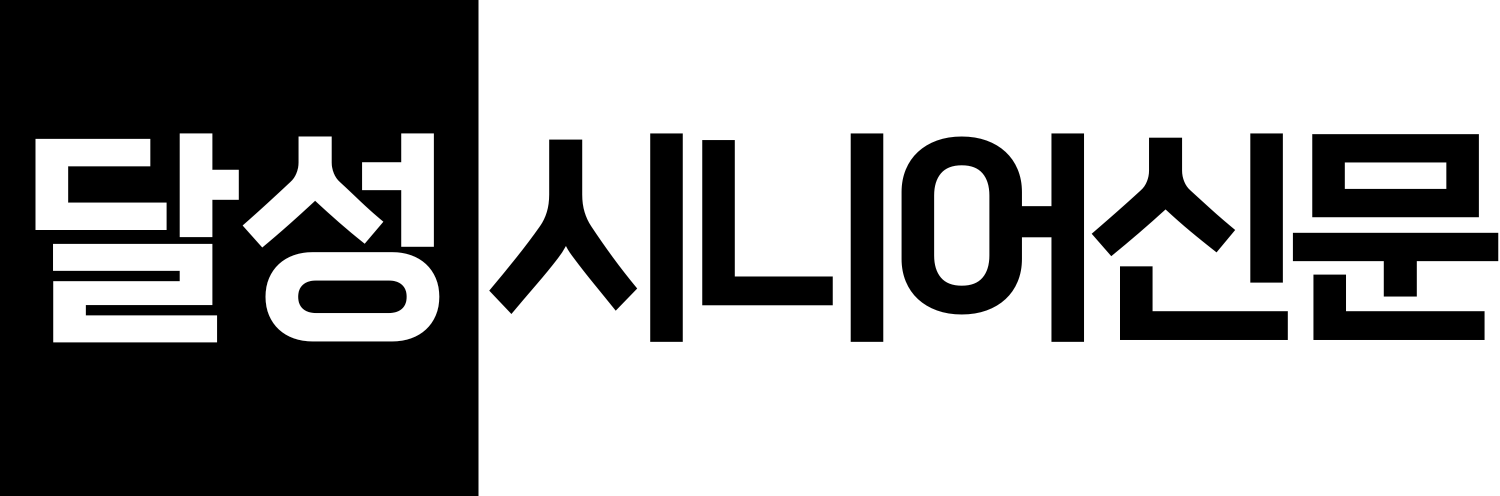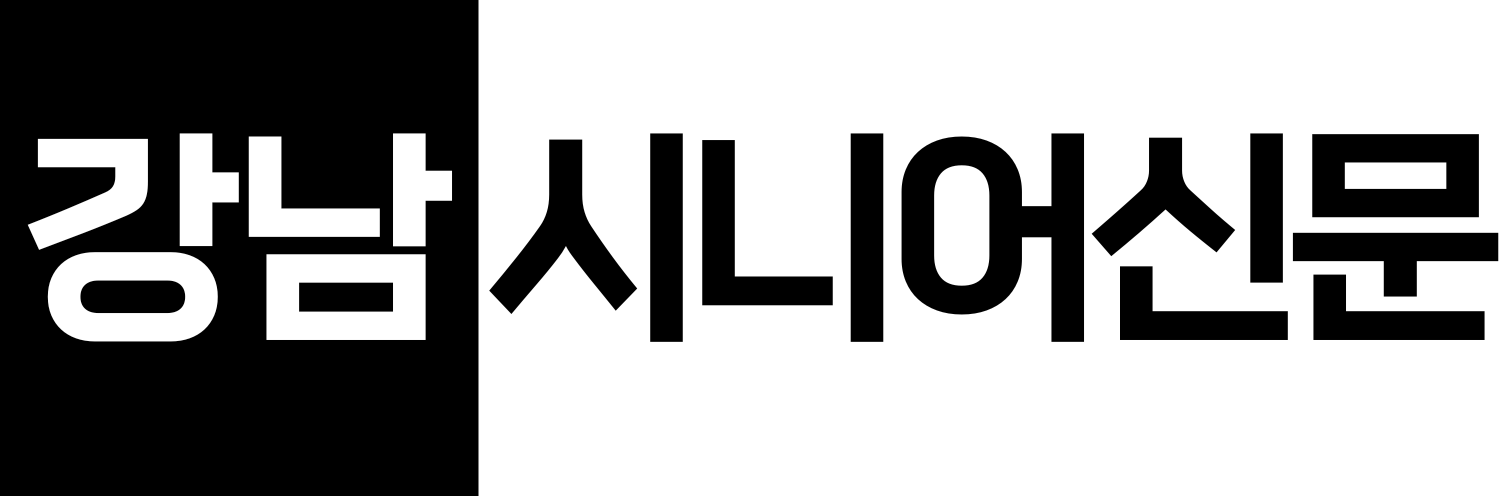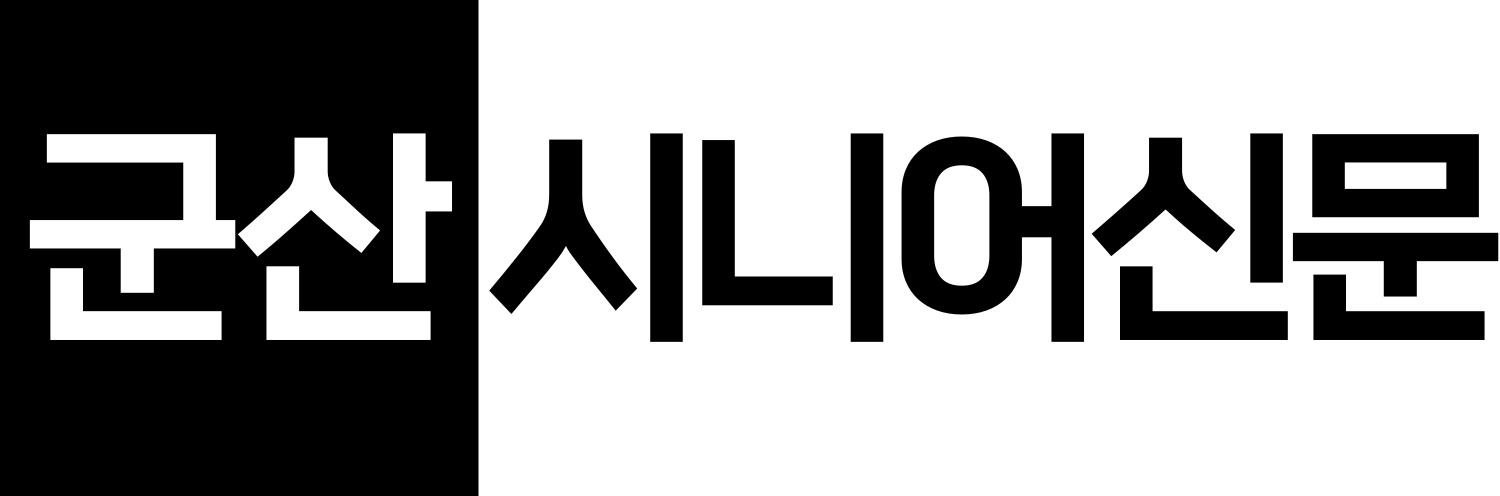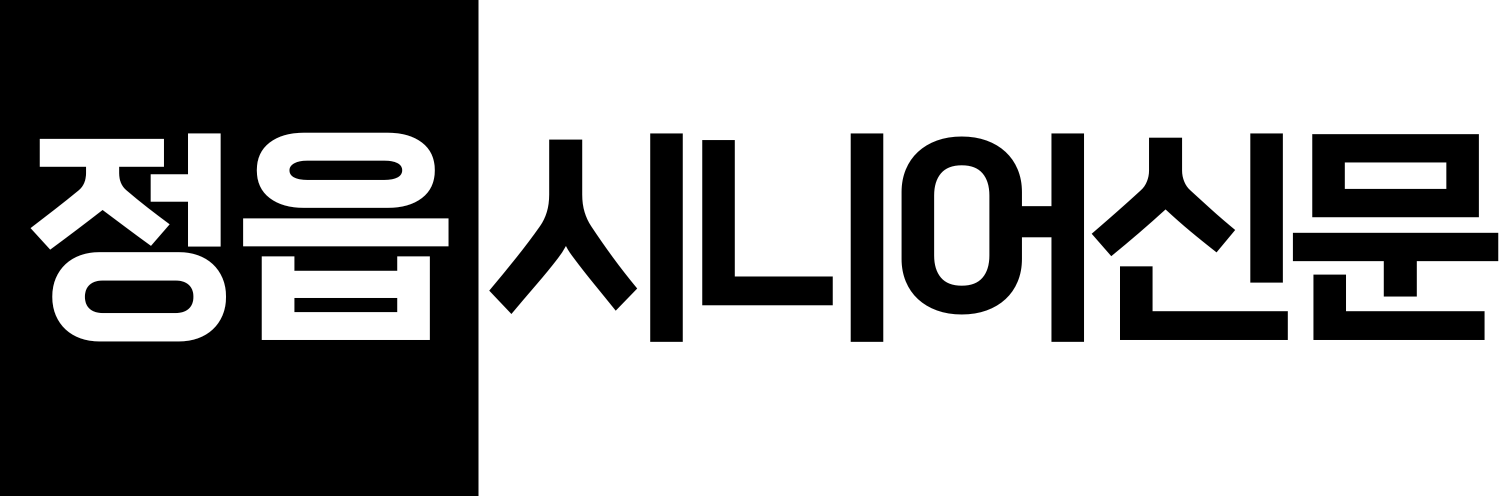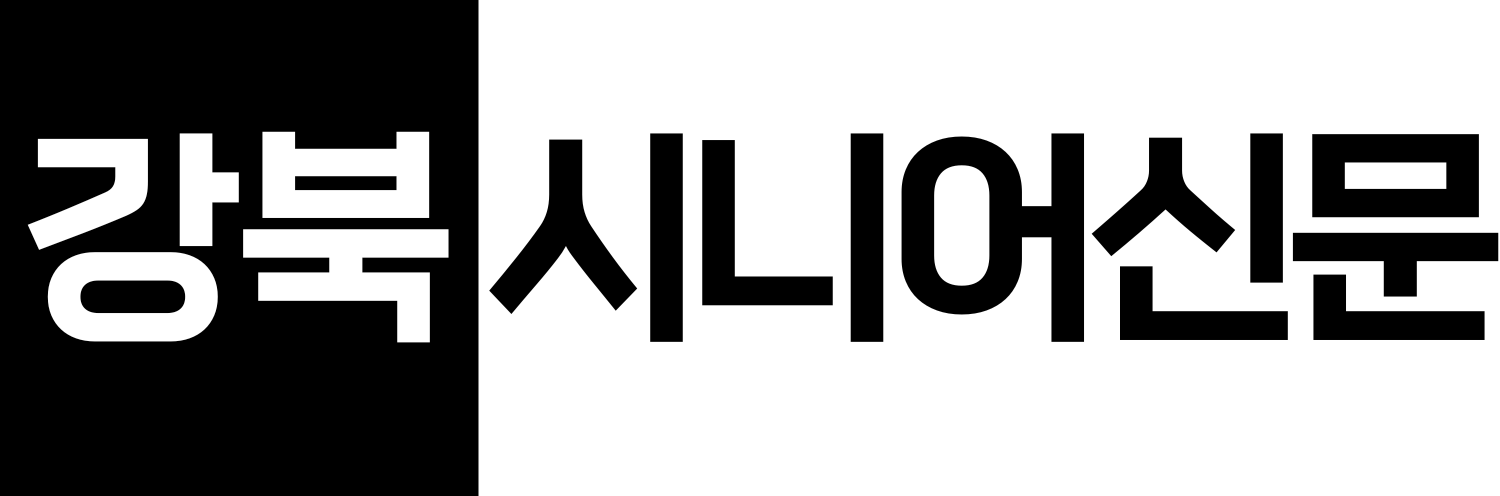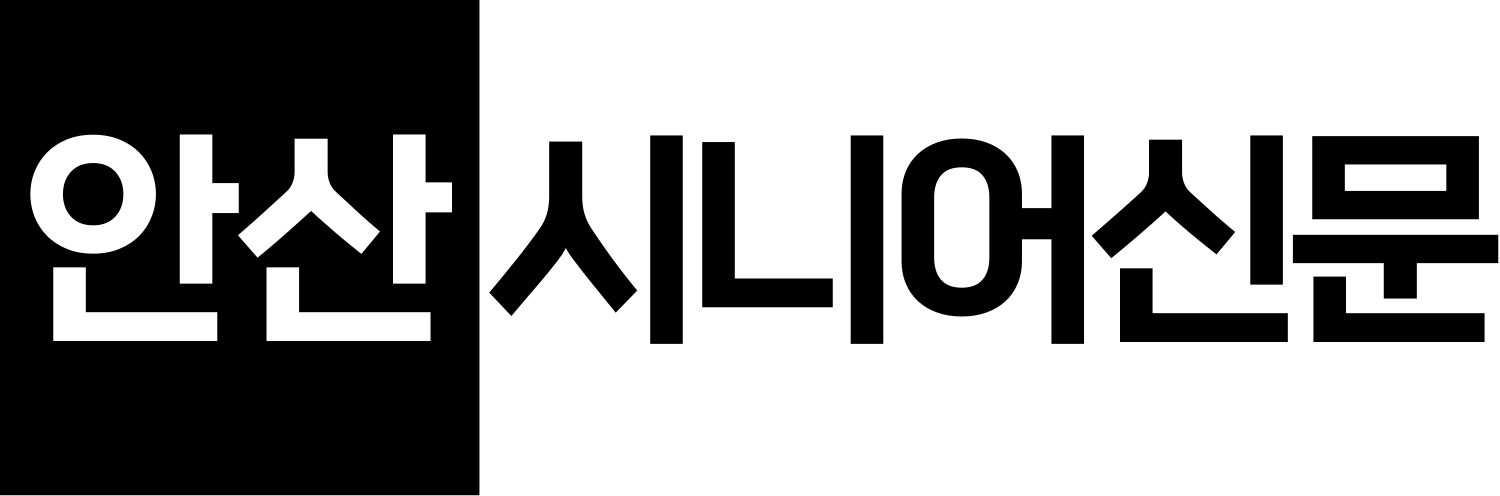최근 꼬막 수확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갯벌 환경과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장도의 전통어업 ‘뻘배’를 지키키 위해 보성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성 갯벌 보전은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갯벌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군은 해수 유통식 방조제와 부유식 선착장을 도입하여 개발과 자연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뻘배를 이용한 전통적인 꼬막 채취 방식은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장도 갯벌의 꼬막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 변화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성군은 꼬막 종패를 뿌리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꼬막 수급 안정화와 생태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벌교읍은 청소차를 이용해 장도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를 육지로 운반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보성군은 2020년부터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보성군은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해양 쓰레기 수거, 패류 양식, 해양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 보호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매월 자발적인 자치 활동을 통해 폐어구와 폐스티로폼을 수거하는 등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장도의 뻘배 어업은 5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으로, 장도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뻘배는 갯벌에서 사람들의 이동을 돕는 중요한 도구로, 형태는 서핑보드처럼 보이지만 갯벌 위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이다.
장도의 아낙네들이 뻘배를 타고 갯벌 위를 달리며 참꼬막을 채취하는 모습은 지역 고유의 전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뻘배를 이용해 한쪽 다리로 갯벌을 밀며 나아가는 모습은 갯벌에서만 가능한 독특한 작업 방식이며, 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장도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벌교 갯벌의 미세한 진흙과 독특한 특성 덕분에 ‘두 발로 들어갔다 네 발로 나온다’는 말처럼 갯벌에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뻘배는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뻘배는 이동과 어업 활동을 돕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 전통 어업 방식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장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중요한 유산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치 덕분에 장도의 뻘배 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로 지정됐다.
주민들은 “보성 갯벌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갯벌 보전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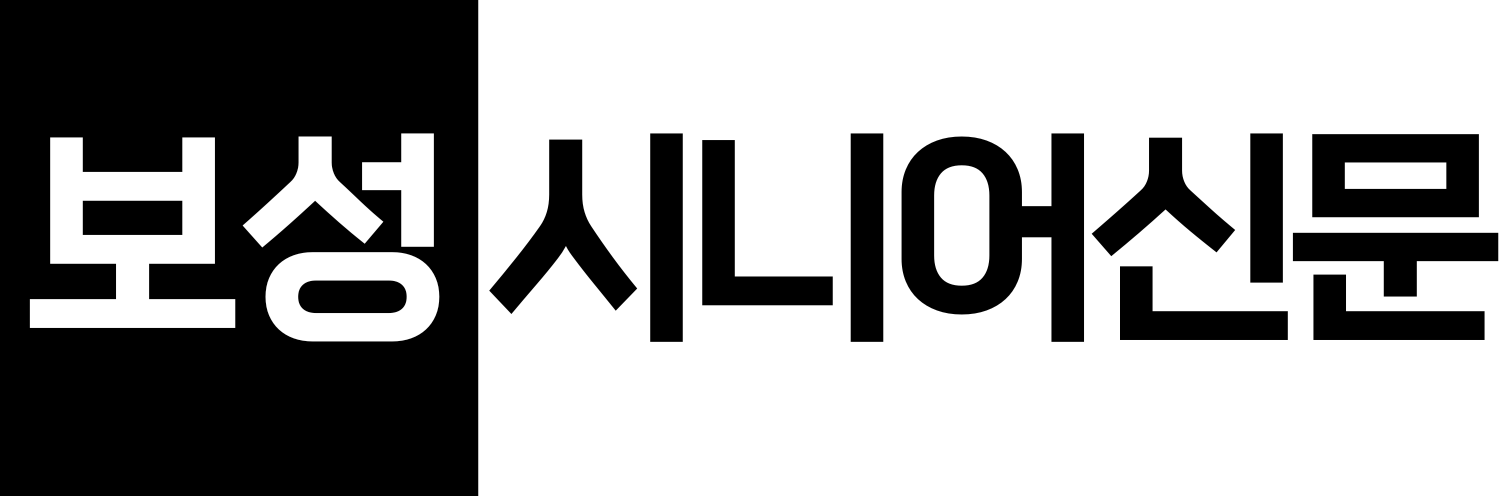

![[기자수첩] 갯벌에 기대 사는 섬, 장도](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5/02/장도-218x15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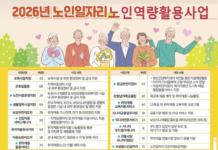


![[기사수첩] 옛 낙안군 천년 물줄기, 상송저수지서 벌교 갯벌까지…물이 이어온 낙안·벌교 역사](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1/낙안에서-벌교로-내려오는-하천-218x150.png)

![[보성에서의 문학산책] (2)나쓰메 소세키 ‘도련님’](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5/12/도련님책표지-218x15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