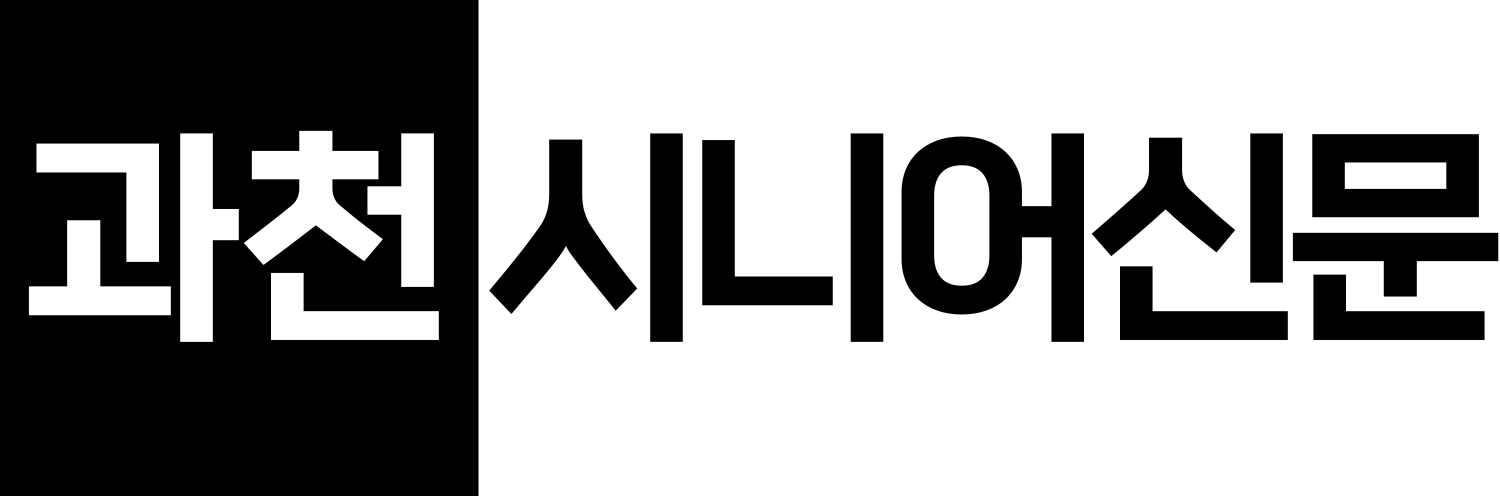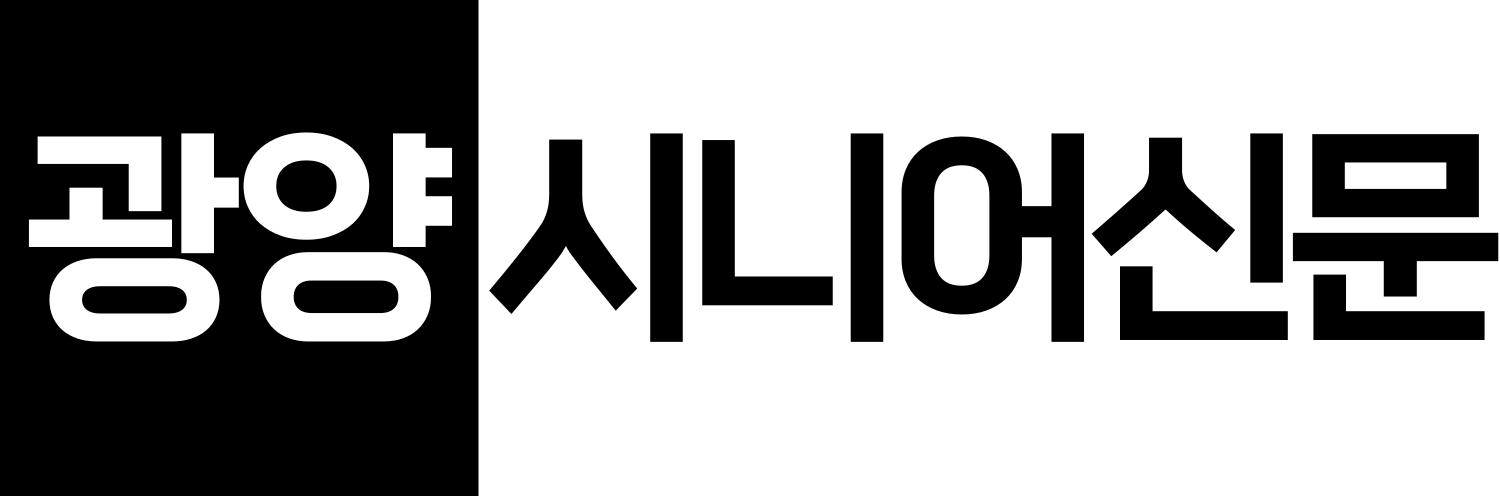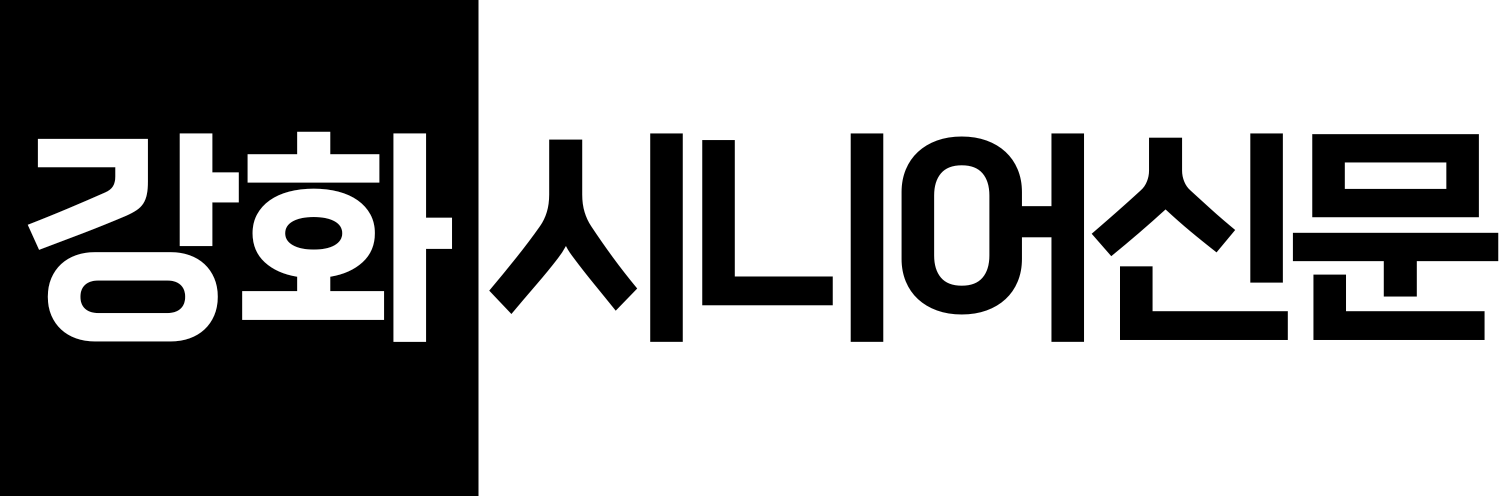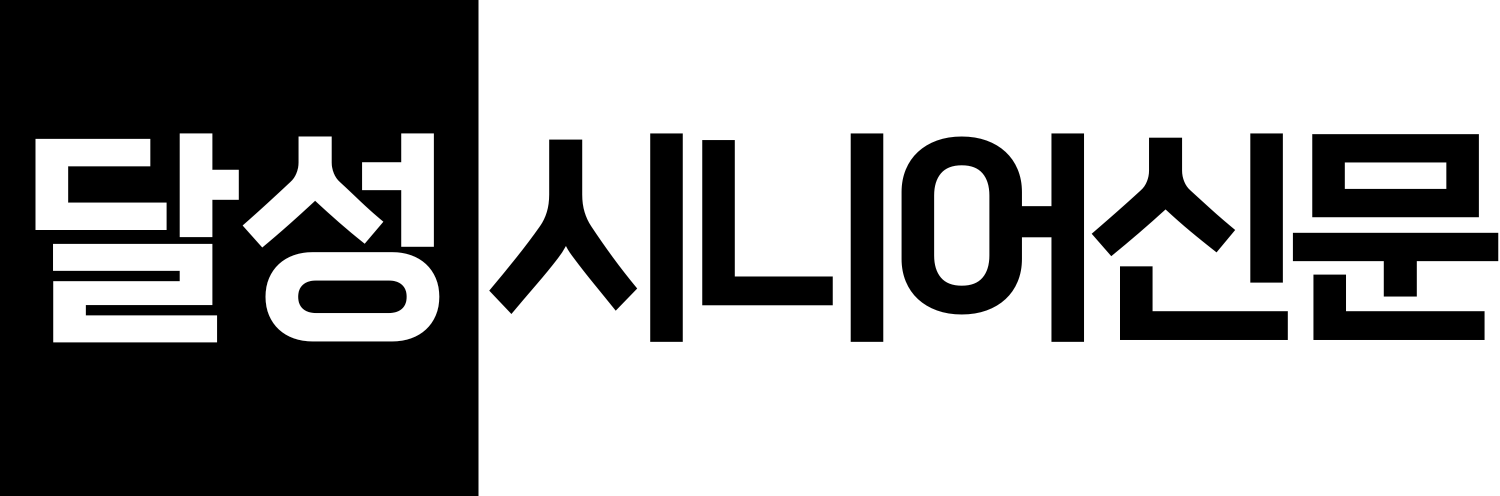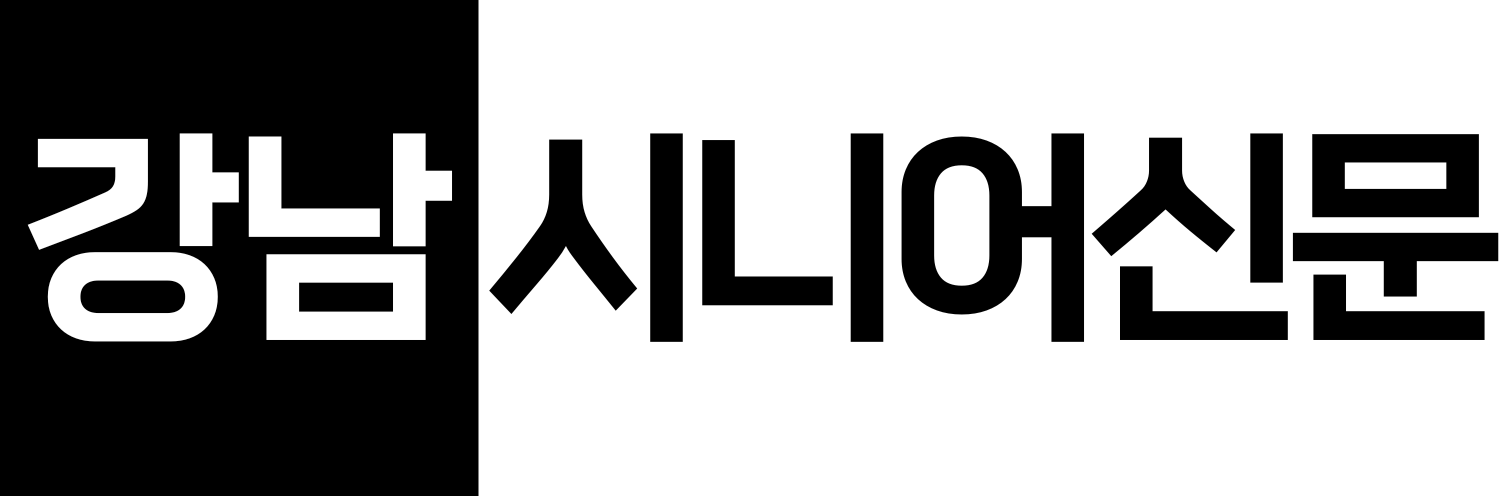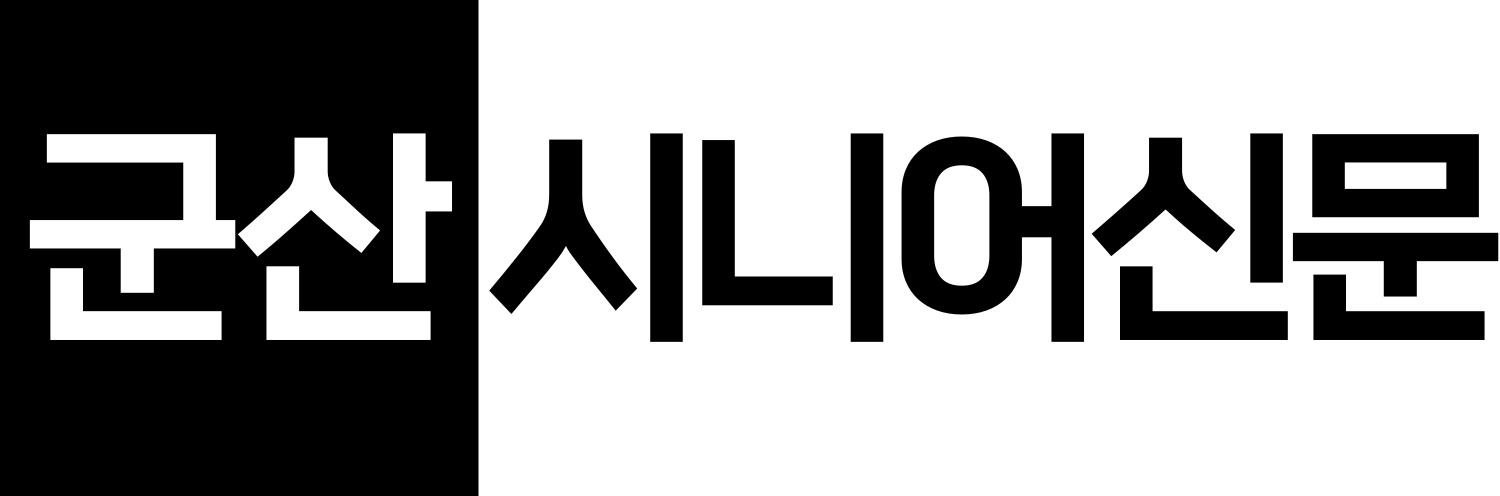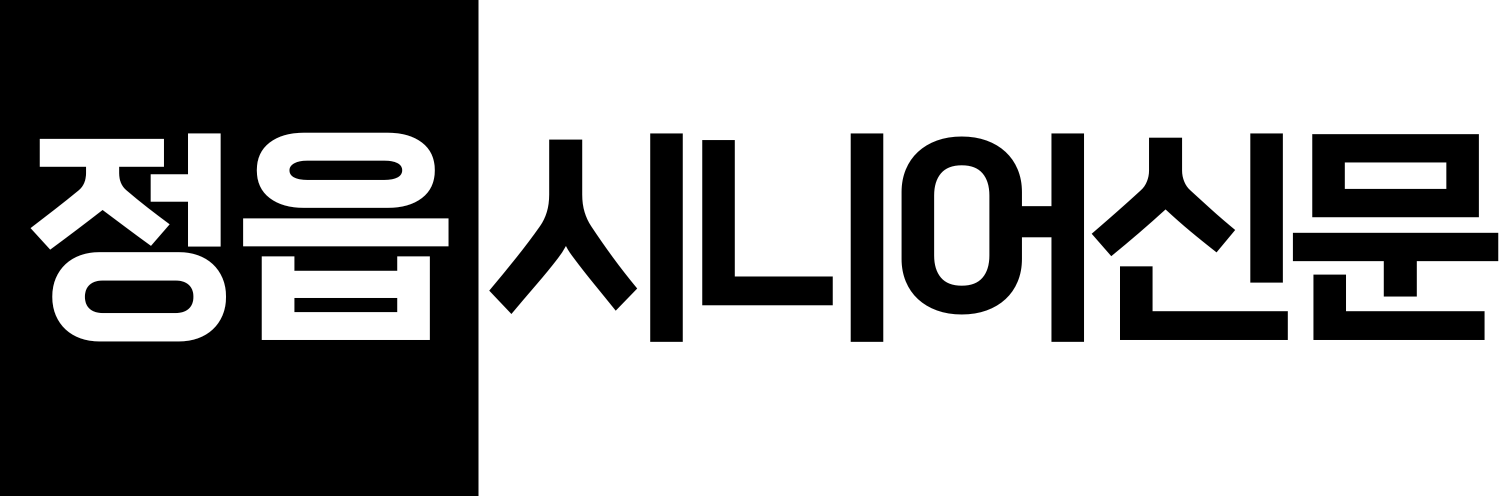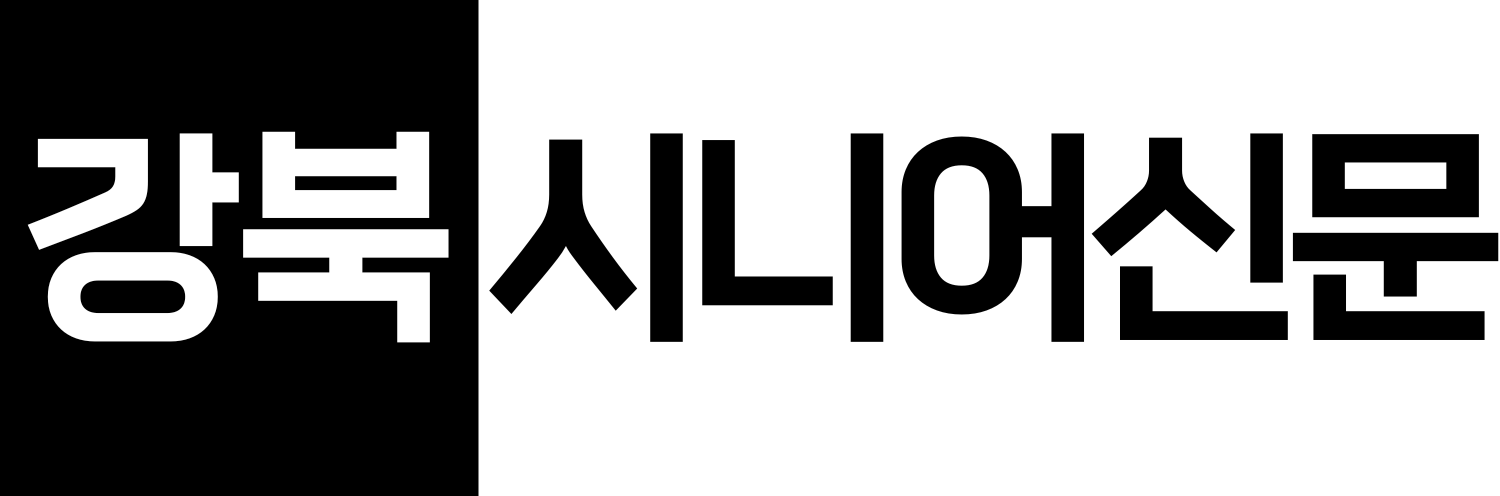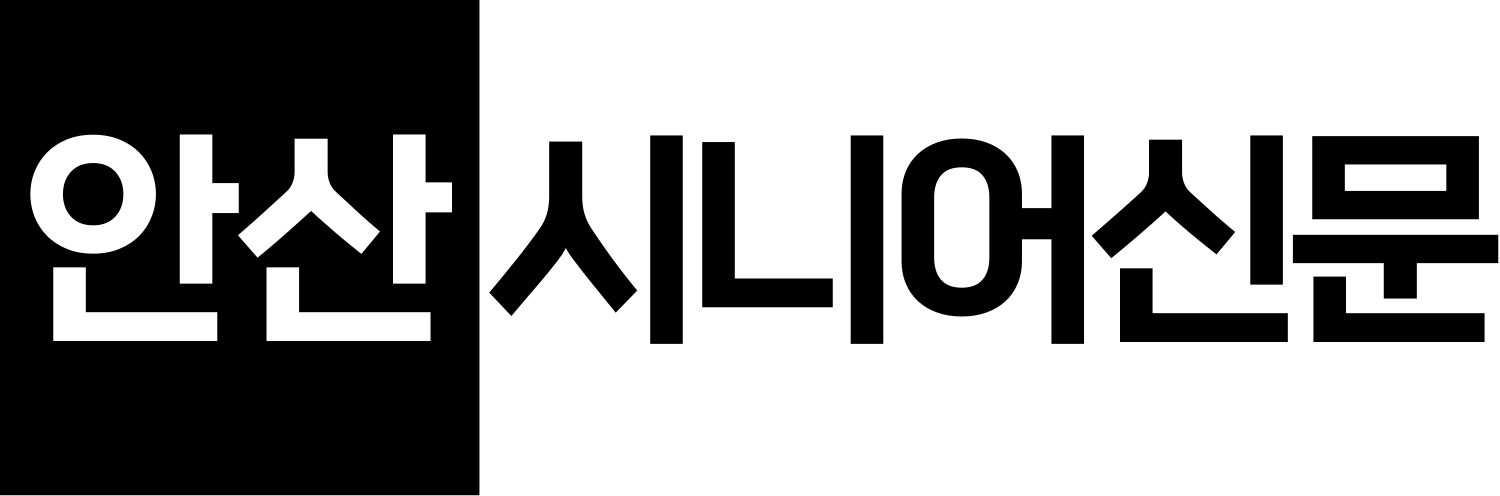보성시니어클럽이 운영하며 ‘태백산맥’ 거리의 명물로 사랑받던 ‘소화밥상’이 결국 문을 닫았다. 정갈한 한 끼로 관광객과 지역민의 허기를 달래주던 공간이자, 12명 어르신의 소중한 일터가 사라진 것이다. ‘소화밥상’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공익형 식당이었다. 8,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과 정성 어린 상차림으로 입소문을 탔으나, 역설적으로 그 인기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갈등의 핵심은 ‘상권 침해’ 논란이었다. 저렴한 가격과 높은 만족도가 인근 식당들에게 위협으로 비춰지면서,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민간 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사업의 시장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행정 당국은 노인 일자리 보전과 지역 상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폐점이라는 뼈아픈 결말을 맞이했다.
그러나 ‘소화밥상’의 폐점은 단순한 식당 하나가 사라진 것 이상의 손실을 의미한다. 우선 평생 쌓아온 손맛을 발휘하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던 시니어 셰프 12명이 자부심을 가졌던 일터를 잃었다. “모자라면 더 먹어”라며 건네던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는 공동체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또한, 벌교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정’을 전하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이자, 저렴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던 지역 복지 안전망의 일부가 멈춰 서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화밥상’을 수익 사업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이곳은 운영비와 세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참여 어르신들께 활동비로 지급하고, 부족분은 공적 재원으로 보전하는 전형적인 사회서비스형 공익사업이다. 즉, 기관의 이익이 아닌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공급식’이 본래의 목적이다.
이번 사례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과 지역 상권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 향후 유사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식당과 겹치지 않는 전통음식이나 특화 도시락으로 메뉴를 차별화하고, 취약계층 급식 중심 또는 예약제 운영 등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상인회와 사전 협의 체계를 구축해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등의 상생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소화밥상’의 불은 꺼졌지만 그곳에 담겼던 온기까지 잊혀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르신 일자리와 지역 상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성숙한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모자라면 더 먹어”라는 그 따뜻한 목소리가 다시 벌교 골목 어딘가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제는 지역 공동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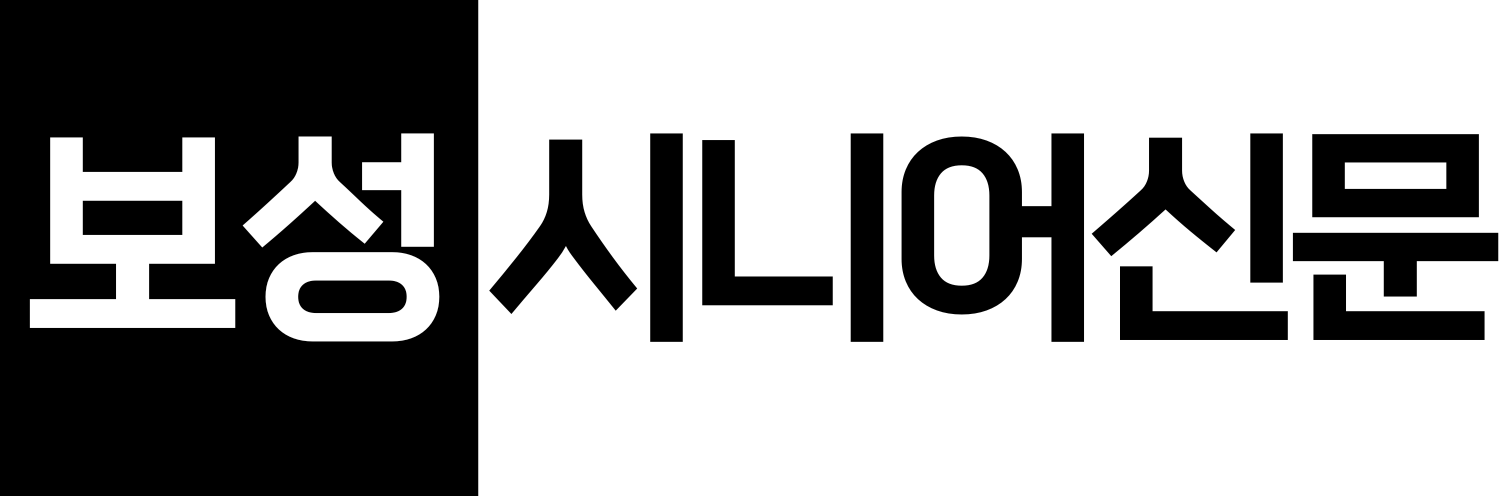


![[기자수첩]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억의 플랫폼, 벌교역](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2/벌교역-218x15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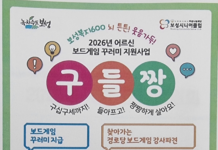
![[기자수첩]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볕이 머무는 양지개… 방죽에 새겨진 생의 기록](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2/장양2-218x150.png)



![[기자수첩] 낙안~벌교 이어지는 천년 물길 ‘벌교천’의 시간](https://boseong-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2/벌교에서-낙안들판-218x150.png)